
최근 회사 동료가 레고 에듀케이션 세션에 다녀온 후 공유한 글을 보고 느낀점을 글로 남깁니다.
동료는 어린 시절 레고를 조립하는 일을 좋아했고, 레고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글에는
- 레고가 어떻게 생각을 구체화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재미를 느낄 수 있었는지 (왜 레고가 독서보다 훨씬 재미있었는지),
- 어떻게 하면 다른 분야에 (우리 회사의 경우 독서 교육에) 레고와 같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장치를 넣을 수 있을지에 관한 고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조화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레고는 많은 것들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열심히 독서랑 레고가 비슷한 사고과정을 거친다 이야기 했지만, 어린시절 저는 레고 조립이 독서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둘 다 머리를 쥐어짜고 정보를 조립하는건데, 왜 레고가 더 재미있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제 결론은 결과물을 만든 이후 만족을 얻는 과정에서 레고가 훨신 직관적이고 쉬웠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힘들게 만들어낸 결과물(사유물)에 대해 만족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 과정이 어려우면 재미를 붙이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명서를 보지 않고 레고를 조립하는 방식의) 레고는 어떻게 생각을 구체화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는가?
- 추상적인 목표(e.g., 오리, 집)를 이루고자 각자의 방법으로 구조화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반복한다.
각자가 생각한 오리의 형태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오리를 레고 블럭으로 만들기 위해선 추상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래밍과도 닮았네요 😁). 여러 가지 사물이나 개념을 추상화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생각을 구체화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레고를 조립하는 것에 어떻게 재미를 느낄 수 있었는가?
- 레고의 경우, 결과물을 만든 이후 만족을 얻는 과정이 직관적이고 쉽다.
레고는 블럭을 가지고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일이 비교적 쉽습니다. 물론 정교함에 따라 난이도는 달라지겠지만, 본인이 생각한 추상화 형태를 누구나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성된 결과물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실물입니다. 감각을 통해 완성을 인지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독서의 경우 느낀점을 추상화하는 방법도 다양하며 (e.g., 독후감 쓰기, 그림 그리기), 단순 줄거리를 쓰는 방식이 아닌 체화한 바를 결과물로 표현해내는 것은 메뉴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성"했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어떻게 하면 다른 분야에 레고와 같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장치를 넣을 수 있는가?
-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쉽게 한다.
글쓰기에 대입해보기
이를 저의 글쓰기에 대입해보았습니다. 저는 글쓰기를 잘 "시작"하지만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결과물을 만든 이후 만족을 얻는 경험이 적다보니 다음 결과물도 잘 완성하지 못합니다.
완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글을 완성도 있게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완성도 있는 문장은 없다.' 라는 말은 유명합니다. 퇴고는 기본으로, 첫 글에 완성도 높은 글을 쓸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의 글을 쓰는 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글을 쓰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글을 쓰는 주기가 길어집니다.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왜 완성도 있는 글을 쓰고 싶어할까?
저는 석사 시절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저널에 게재할 논문을 쓰기 위해 보냈습니다. SCI급 저널이 아닌 이상 투고하지 못했고 첫 논문을 쓰기까지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배움이 많았습니다. 연구의 결과를 임팩트있게 보여주기 위해 초석부터 다지고, 거진 한 문장마다 출처를 달 정도로 정확도 높은 문장만을 나열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기 위해 몇 번이고 고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논문을 완성할 동안 작은 성취 없이 보내다보니 자꾸 글을 완성하지 못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멋진 글을 완성하고 싶다는 욕심만 생겼습니다. 특히 과학적 글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나의 글을 완성하기까지 관련 지식을 모두 정리하고, 글을 쓰고 퇴고하는 과정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결과물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 이상해도 우선 완성한다. 내가 쓴 문장이 읽기 어렵더라도 무시하고 문장을 마무리한다.
- 멋진 글을 쓰고싶다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다.
- 정해진 시간에 5분이라도 글을 쓴다.
- 완성한 글을 블로그에 게재한다. 설령 이상할 지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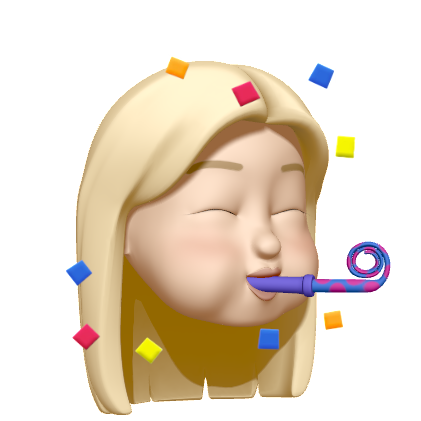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레고처럼 막 하다보면 오히려 멋질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