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분은 곧 권력이다. 내가 겪은 스타트업의 리얼한 주주총회,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이론들
오늘은 개발자가 아닌, 투자자로서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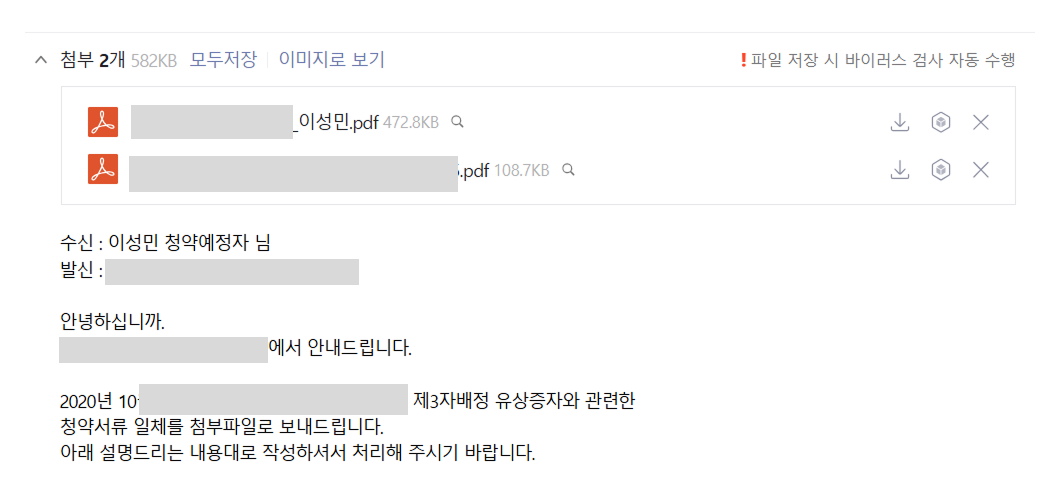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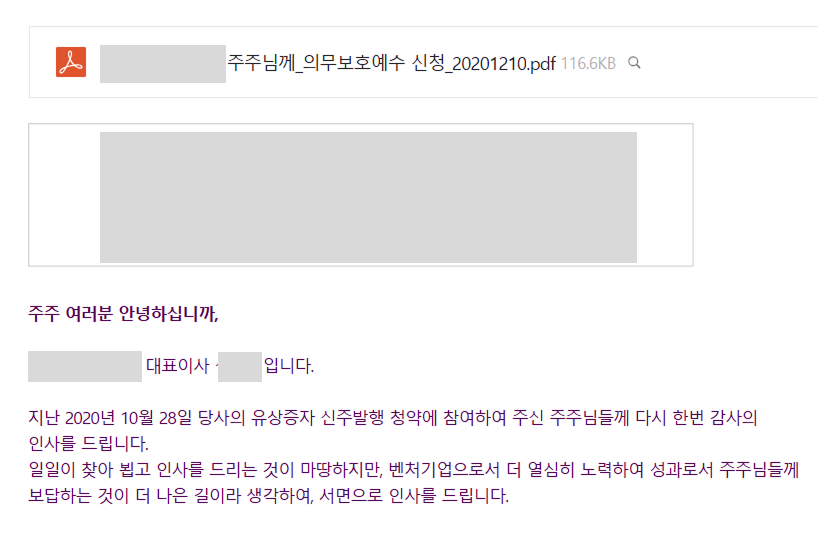
약 4년 전, 저는 한 AI 스타트업에 앤젤투자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기술력도 있었고, 시장의 반응도 좋아 Series B 투자 유치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졌죠. 당시 저는 전체 주식 390만주 중 xx만주를 인수하며 약 5% 미만의 지분을 가진 소액 투자자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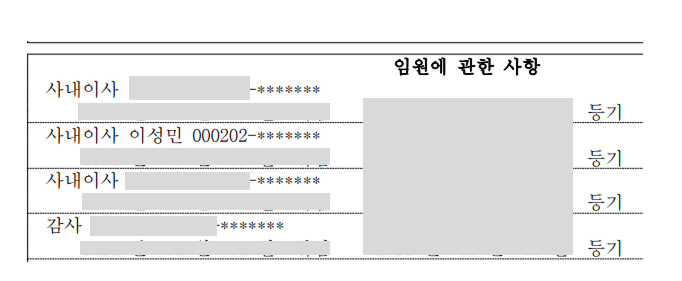
스타트업을 경험하기도 했고 실패한 스타트업의 Co-Founder로써의 경험도 있던 저는 앤젤투자가 한창 궁금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번 도전! 해봤던 응애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상하지 못했던 “경영권 분쟁”이라는 현실이 저를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기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 현실에서 마주한 주주총회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로 인해 그는 퇴임하게 되었고, 이후 새로운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수차례 열렸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대표이사를 다시 사내이사로 선임하려는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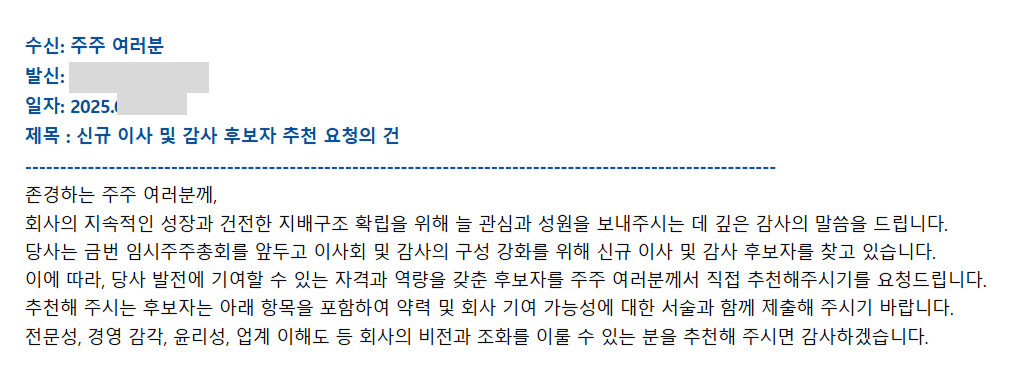
| 항목 | 수치 |
|---|---|
| 총 의결권 주식 수 | 290만주 |
| 전 대표 찬성표 | 125만주 (43%) |
| 결과 | ❌ 부결 (과반 미달) |
✔️ 43%나 되는 주주가 배임 전력이 있는 전 대표의 복귀에 찬성한 것입니다. 과반은 넘지 못해 부결되긴 했지만, 그 수치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 교훈 1: 스타트업에서 '지분'은 단순한 금전적 권리가 아니다
스타트업의 지분은 다음 3가지 권리를 내포합니다:
1. 경제적 권리
- 배당, 잔여재산 청구권
2. 의결권
-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권
- 이사/감사 선임, 정관 변경, 합병 등
3. 정보권
- 사업 보고서, 회계장부 열람 등
⚠️ 이 중 가장 강력하고 위태로운 건 바로 의결권입니다.
투자 당시 아무도 "의결권"의 힘과 리스크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기본중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정당한 내 권리는 주식 수에서 나옵니다.
-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스타트업에서의 초기 지분 구조가 곧 의사결정 구조이며, 권력 구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 퇴임한 대표는 여전히 대주주였기에, 강력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저는 소액 투자자로서, 반대표를 던졌지만 실질적인 견제력은 없었습니다.
🧠 이론으로 보는 스타트업 지분 구조의 본질
🧩 1. 거버넌스(Governance)의 핵심은 '지분과 의결권 분리'에 있다
전통기업 vs 스타트업
| 구분 | 전통 대기업 | 스타트업 |
|---|---|---|
| 지분 구조 | 다수 주주 + 분산 소유 | 소수 중심 (창업자, 초기 투자자) |
| 의결권 구조 | 이사회 중심, 견제 가능 | 창업자 중심, 집중적 권력 |
| 감시 시스템 | 감사, 이사회, 내부통제 | 없음 or 창업자 독점 |
✔️ 스타트업의 초기는 '전제군주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분 설계는 곧 헌법 설계입니다.
⚖️ 2. 의결권 집중의 양면성
| 장점 | 단점 |
|---|---|
| 빠른 의사결정 | 독단 가능성 |
| 책임 중심의 권력 구조 | 배임/횡령 발생 시 통제 불가능 |
| 투자 유치 과정 단순화 | 소수견제 실패시 경영권 탈취 가능 |
이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중 의결권 구조(Dual-Class)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예: Class A = 1주 1표, Class B = 1주 10표)
📊 스타트업 단계별 지분 전략: 현실과 이론의 조화
| 단계 | 창업자 지분 | 투자자 지분 | 핵심 체크포인트 |
|---|---|---|---|
| Pre-Seed | 100% | 0% | 법인 설립, 공동창업자 지분 합의 |
| Seed | 70~90% | 10~30% | SHA(주주간계약), 의결권 제한 가능 |
| Series A | 40~70% | 30~60% | 이사회 구성, 우선주 구조 |
| Series B+ | 20~40% | 60~80% | 경영권 방어 장치, 스톡옵션 풀 확대 |
🛡 의결권과 경영권 방어 전략
✔️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제도적 장치
| 장치 | 설명 |
|---|---|
| SHA(주주간계약) | 주요 결정시 공동 합의 필요, 드래그얼롱/태그얼롱 조항 포함 |
| 우선주 발행 | 투자자에게 배당 및 청산 우선권, 의결권 제한 가능 |
| 이사회 구조 | 투자자와 공동 참여, 일부 안건은 이사회 전결로 제한 |
| 스톡옵션 풀 | 지분 희석을 통제하며 인재 유치 |
| 배임 시 해임권 조항 | 일정한 조건 발생 시 강제 해임 가능 |
🧠 경제학/법학 이론 배경
📘 1. 대리인 이론 (Agency Theory)
“경영자는 주주의 대리인이다.”
- 스타트업에서는 창업자가 경영자이자 대주주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 리스크가 낮다고 보지만,
- 실제로는 “공동창업자, 소액주주,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빈번합니다.
⚠️ 권한이 집중될수록 감시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다.
📕 2. 기업지배구조론 (Corporate Governance)
-
기업은 ‘지분’을 바탕으로 형성된 의사결정 공동체
-
단, 스타트업은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늦기 때문에 초기 지분 구조가 사실상 헌법
| 구성 요소 | 의미 |
|---|---|
| 주주총회 | 입법부 |
| 이사회 | 행정부 |
| 감시 장치 | 사법부 |
스타트업은 이 3권이 창업자 1명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음.
📒 3. 게임 이론 관점
- 주주총회는 다수결 게임
- 의결권 확보가 ‘우호세력 구성 게임’이 되며, 때로는 연합/배신/이탈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함
-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라 소액주주는 항상 불리함
📌 지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할 요소
1. 책임의 무게
창업자가 51% 이상의 책임과 의결권을 지녀야 핵심 의사결정을 수행 가능
2. 장기 인센티브 설계
공동창업자에게는 스톡옵션 + 베스팅 조건을 활용해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
3. 투자자 의결권 제한
우선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SHA를 통해 의결권 블로킹 조건 설정
🧩 예비 창업자를 위한 조언
🔧 1. 팀 빌딩과 지분 분배는 어떻게?
초기 공동창업자와 팀빌딩 시, 관계보다 역할 중심의 분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친구, 지인이라는 이유로 균등 분배하면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지분 베스팅 조건 필수
예: “2년 이상 근무 시 지분 100% 확정”, “1년 후부터 매월 1/36씩 확보”
→ 이탈 방지 및 책임 확보
🛡 2. 경영권 방어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 전략 | 설명 |
|---|---|
| 우호지분 연대 확보 | 공동창업자, 초기 투자자와 신뢰 기반의 의결권 연대 |
| SHA(주주간 계약) |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공동결정 구조 명문화 |
| 우선주 vs 보통주 구조 설계 | 투자자에게 경제적 권리는 주되, 의결권은 제한 |
| 이사회 구성 주도권 확보 | 중요한 안건은 이사회 통과가 전제되도록 정관 설정 |
| 스톡옵션 풀은 선확보 | 후속 채용과 보상 구조 유연성 확보 |
| 비상 시 권리 행사 조항 삽입 | 예: 배임 발생 시 강제 해임권, 우선매수권 등 |
🎯 왜 창업 초기에 대표자는 90%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야 하는가?
1. ✅ “대표자는 결국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 사업이 망하면 채무, 법적 책임, 투자자와의 관계 정리 등 실질적인 부담은 모두 대표자에게 집중됩니다.
- 그에 비해, 공동창업자나 초기 합류자는 상대적으로 책임은 적고 권리만 많아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책임 = 권한” 구조가 지분에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 “지분은 참여의 대가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반영하는 것이다.”
2. 🛡 경영권 방어는 곧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다
- 대표자가 50% 미만의 지분만 가져가면, 공동창업자와의 마찰이나 투자자와의 대립 시 경영권을 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특히, 스타트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초기 판단 하나가 기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 상황 | 결과 |
|---|---|
| 대표 지분 51% 이상 | 전략·투자 등 의사결정 주도 가능 |
| 대표 지분 30~49% | 공동 의결권자 설득 필요 → 분쟁 가능성 ↑ |
| 대표 지분 < 25% | 주요 정관 변경조차 막기 어려움 (특별결의 대응 불가) |
3. 🔧 공동창업자·핵심인력 보상은 “지분 희석 없는 방식”으로 가능
- 핵심 팀원에게 스톡옵션, 보너스, 성과급, 별도 계약 조건 등을 통해 충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초기 합류했으니 20% 달라”는 논리는 책임 대비 과도한 권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 대표자는 향후 투자 라운드에서 지분이 계속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여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4. 📉 대표자의 지분이 낮으면 후속 투자 유치도 불리
VC나 기관투자자들은 대표자의 지분율을 유심히 봅니다.
대표자가 30% 이하의 지분만 가진 상태라면:
“과연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회사를 이끌 수 있을까?”
“경영권을 잃을 경우, 우리 투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 그래서 많은 투자자는 대표자의 지분율이 Series A 전까지는 최소 60~70% 이상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 정리하면:
| 이유 | 설명 |
|---|---|
| 책임 집중 |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대표자가 떠안기 때문 |
| 경영권 방어 |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생존을 위한 구조 필요 |
| 장기 전략 주도 | 후속 라운드 대비 및 사업 비전 유지 가능 |
| 투자자 신뢰 확보 | 대표자의 지분율은 “장기 책임”의 신호로 간주됨 |
💡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지분은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를 지키고 책임지는 구조의 중심축입니다.
팀원에게는 신뢰로, 투자자에게는 안정성으로 작용합니다.”
🎯 마무리 정리
| 대표 지분율 | 권장 | 표준 (VC 관점) |
|---|---|---|
| 단계 | 최소 지분율 | 권장 지분율 |
| Seed | 90% 이상 | 100% (합의 전) |
| Series A | 60% 이상 | 70% 이상 |
| Series B | 40% 이상 | 50~60% 이상 |
✅ 요약 핵심
| 교훈 | 설명 |
|---|---|
| 지분은 권력이다 | 투자금 이상의 영향력을 갖게 되는 구조 |
| 경영권 방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최소 51% 통제 or 구조적 우위 확보 |
| SHA와 이사회는 헌법이다 | 스타트업 거버넌스는 ‘계약’으로 시작한다 |
| 의결권 리스크는 조기 설계로 해결 | 우선주/베스팅/이사회 구조가 핵심 |
| 경영자 책임과 권한은 비례해야 한다 | 희생의 무게만큼 권한이 필요하다 |
🔚 마무리하며
이번 경험은 투자자로선 실패일 수 있지만, 창업자로선 아주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 “지분 구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회사의 권력 구조를 보여주는 설계도”
초기 창업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 한 문장 요약
“스타트업 지분 설계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미래를 위한 정치 설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