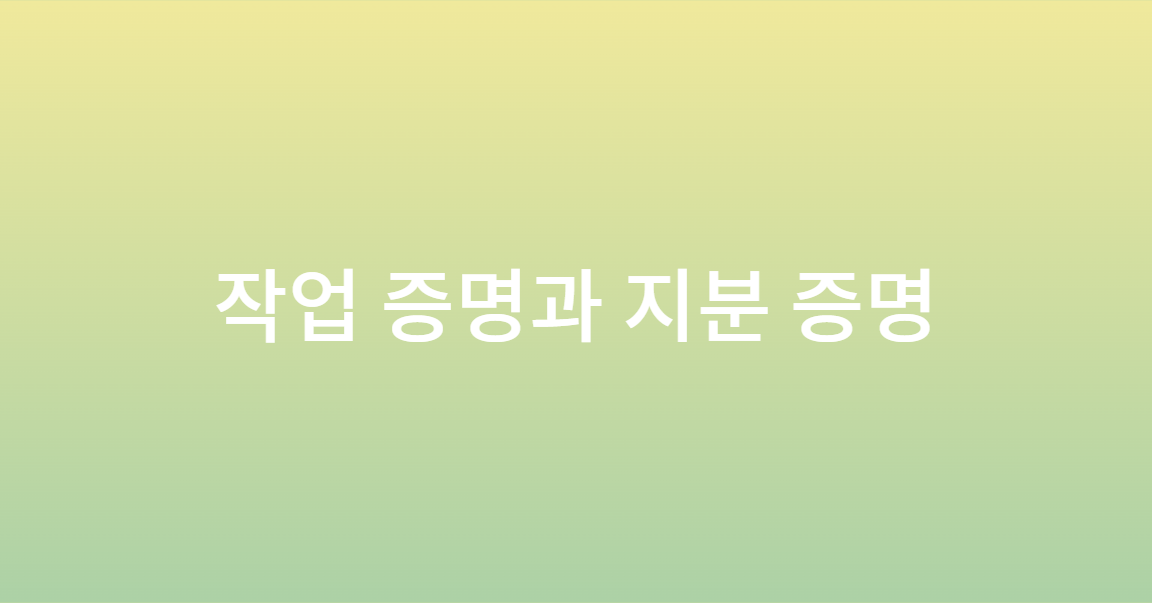도대체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이 무엇인가? 어려운 용어들은 차, 포 다 떼고 쉽고 간결하게 이해해보자. 약간의 비약과 의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이들은 합의 알고리즘이라기 보다는 블록을 생성할 권한을 누구에게 주느냐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Proof of Work(PoW)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가져라.
Proof of Work는 작업 증명이라는 의미로, 비트코인에서 블록 생성 권한을 위임하는 규칙이다. 채굴 행위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의 소중한 거래 데이터를 수정 불가능한 투명성이라는 선한 명목하에 공개 처형할 수 있도록 블록에 기록하고 체인에 연결하는 일련의 행위를 일컫는다. 그러나 해시화된 지갑 이외의 다른 개인 정보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한다.
한마디로 거래 원장(원본 장부)을 블록에 기록해서 이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당수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이러한 컴퓨팅 파워를 소모해가면서까지 데이터를 블록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오타쿠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블록 생성의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PoW, 작업 증명이다.
오타쿠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블록의 정답(nonce)보다 작은 값을 정답으로 찾아야 한다. 이 정답을 찾는 일을 컴퓨터가 한다. 그래서 컴퓨팅 파워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이 정답에 규칙이 있는가? 없다. 보안 해시로 만들어진 64자리 16진수 숫자이기 때문에 규칙이 없다. 그냥 무작위로 숫자를 때려 박아서 target 값보다 낮은 값을 찾아내면 성공하는 것이다.
채굴은 왜 하는가?
채굴을 하면 보상으로 코인을 준다. 여기서 보상으로 주는 코인이 바로 따끈 따끈한 신생 발행 코인이다. 비트코인의 코인 발행은 채굴로써만 이루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왜 보상으로 코인을 주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외주 받은 사람한테 돈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AWS 쓰면 아마존에 매달 결제하듯이, 우리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해주는 일을 하면 그에 대해 수고 많으시다고 보상으로 코인을 주는 것이다.
블록체인 채굴자는 보상 코인 이외에도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도 가져간다. 수수료를 떼어 간다는 것의 개념은 중간에 누가 털어 먹는다는 것이다. 채굴자들은 가히 중간업자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러나 '탈중앙화'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니 그러려니 해주자. 필자는 블록체인은 대중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술 앞에서 논리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 보상은 문제를 푼 사람에게 모두 다 주나요? 아니요. 가장 먼저 푼 사람한테만! 줍니다.
둘이 동시에 채굴하면 어떻게?
네트워크의 딜레이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면 우선 승자(블록 생성 권한자) 판단을 보류한다. 그리고 제한 시간 한 시간 동안에 둘 중 더 긴 체인을 만든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치킨 게임을 시작한다. 블록은 10분에 한 개씩 생기므로 한 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은 블록이 최대 6개 생길 수 있는 시간이다. 참고로 비트코인에서는 가장 긴 체인을 가지고 있는 노드가 가장 정직하다.
진 사람의 블록은 ophaned block이 된다. 한 마디로 새 됐다고 봐도 되는... 그냥 쓸모 없어지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생성과 반감기
비트코인의 블록은 10분마다 한 개가 생성되는 것이 규칙이다. 때문에 10분보다 빠르게 블록이 채굴되면 다음 블록 채굴의 난이도는 올라가고, 10분보다 느리게 채굴되면 채굴의 난이도가 낮아진다.
비트코인에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채굴 보상의 양이 늘 같다면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량 발행되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반감기이다. 4년에 한 번 보상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바로 반감기이다.
첫 채굴 보상은 50BTC였고 2023년 현재 기준 채굴 보상은 6.25BTC 이다. 6.25와 깊은 연관이 있는 한국은 2024년 6번째 반감기가 오기 전에 채굴해서 NFT에 영구 저장해두면 어떨까?
Proof of Stake(PoS)
가장 돈 많은 사람이 가져라.
주식을 하시나요? 주식에 대주주 개념이 있다. 대주주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대박 많이 갖고 계신 오타쿠를 의미한다.
너 지갑에 돈 얼마있어? 너 돈 많아? 제일 많아? 그럼 너가 주인해. 이게 바로 지분 증명이다. 돈 많은 사람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더리움도 원래 PoW 방식을 사용했다. 그런데 이 방식에서 컴퓨팅 에너지 낭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더리움 2.0에서부터는 전면 PoS를 도입하였다.
이오스는 dPoS라는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을 합의 알고리즘으로 채택했다. 이건 개미 주주가 너무 많은 삼성전자 같은 주식에서 주주한테 다 권한을 주기 뭐 하니까 압도적으로 지분이 많은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개념이다.
부자는 생태계에 큰 기여를.. 하겠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이더리움(돈)이 많다는 것은 이더리움 생태계에 기여를 많이 했다는 것의 반증이다. 뭐 어떻게 이더리움을 많이 갖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로를 인정해준다.
하지만 '사토시의 서'라는 책에서 다루듯, 지출 대신 저축을 한다는 것은 소비를 나중으로 미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지분 증명이 아니라 거래 증명을 채택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싶기도 하다.
결론
탈중앙화고 나발이고 자본은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