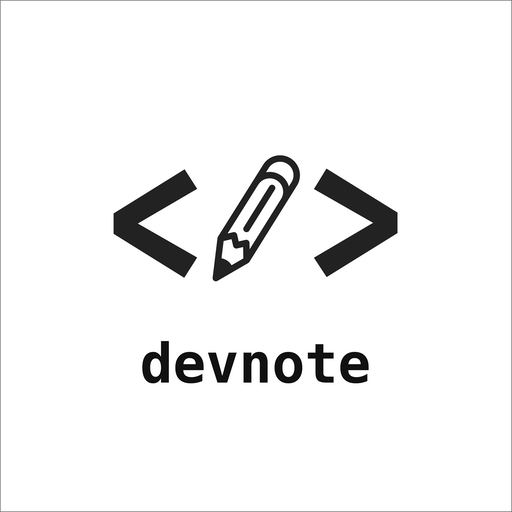왜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어제(4월 15일)부로 항해99의 공식적인 스케줄은 모두 끝이났다. 아직 끝났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이력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넣어야 하는 단계까지 온걸 보면 얼추 취업의 문턱까지 왔지 싶다.
그리고 그 문턱에서 뭔가에 막힌듯한 느낌을 받았다.
일단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은 걸까.
도대체 왜 하필 개발자여야 했을까
먼저, 어떤 개발자가 되야한다고 적기전에 왜 개발자가 되고 싶었는지 부터 생각해야 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거나, 실내에 앉아서 편하게 일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전직장에서도 실내에 앉아서 일하면서 돈은 많이 벌수 있었다.)
개발자라는 직업을 알기 전에는 하루종일 컴퓨터앞에 앉아서 글자들이 검은 화면에 떠있는 것을 하루종일 쳐다보고 수정하는 사람이겠거니 했다.
 (이마저도 조금 찾아본 후에 알게된 나의 예상이었다)
(이마저도 조금 찾아본 후에 알게된 나의 예상이었다)
사실 전직장들에서는 누군가 만들어놓은 프로덕트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일을 했다. 왜 이렇게 만들었지 무엇을 위한것인지 깊이 알지 못한채 '그냥' 팔았다. 그러다 문득 판매자가 아닌 메이커로써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직접 소비자들의 심리를 예상하고 사용성을 따져서 그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개발자가 되겠다고'.
"개발자가 되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항해99에 등록해서 1월 10일부터 정신없이 달려 4월 15일 모든 과정을 다행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잘 마쳤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순간의 시작이다.
이력서를 작성하기 위해 앉아서 글을 쓰려는데, 내가 한 프로젝트와 기술들을 나열한 후 문득, 나는 내가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은걸까에 대한 물음이 들면서 한동안 글을 적지 못했다.
그러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타다: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을 보게 되었다. 영화는 2018년도부터 운영됐던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타다금지법'이라고 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을 때 스타트업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지 관찰하고 추적한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영화 배경 음악이 너무 좋았다. 들어보실 분은 👉 음악들으러가기)
이 영화를 보고 하나의 서비스를 위해 여러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구체화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 고무적이고, 그들이 내놓은 프로덕트가 세상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한 부분으로 남는 모습이 나의 가치관과도 너무나 잘 맞았다.
그중에서도 모든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세상에 내놓는 자리가 개발자임을 보고 메이커로써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역동적인 삶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나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