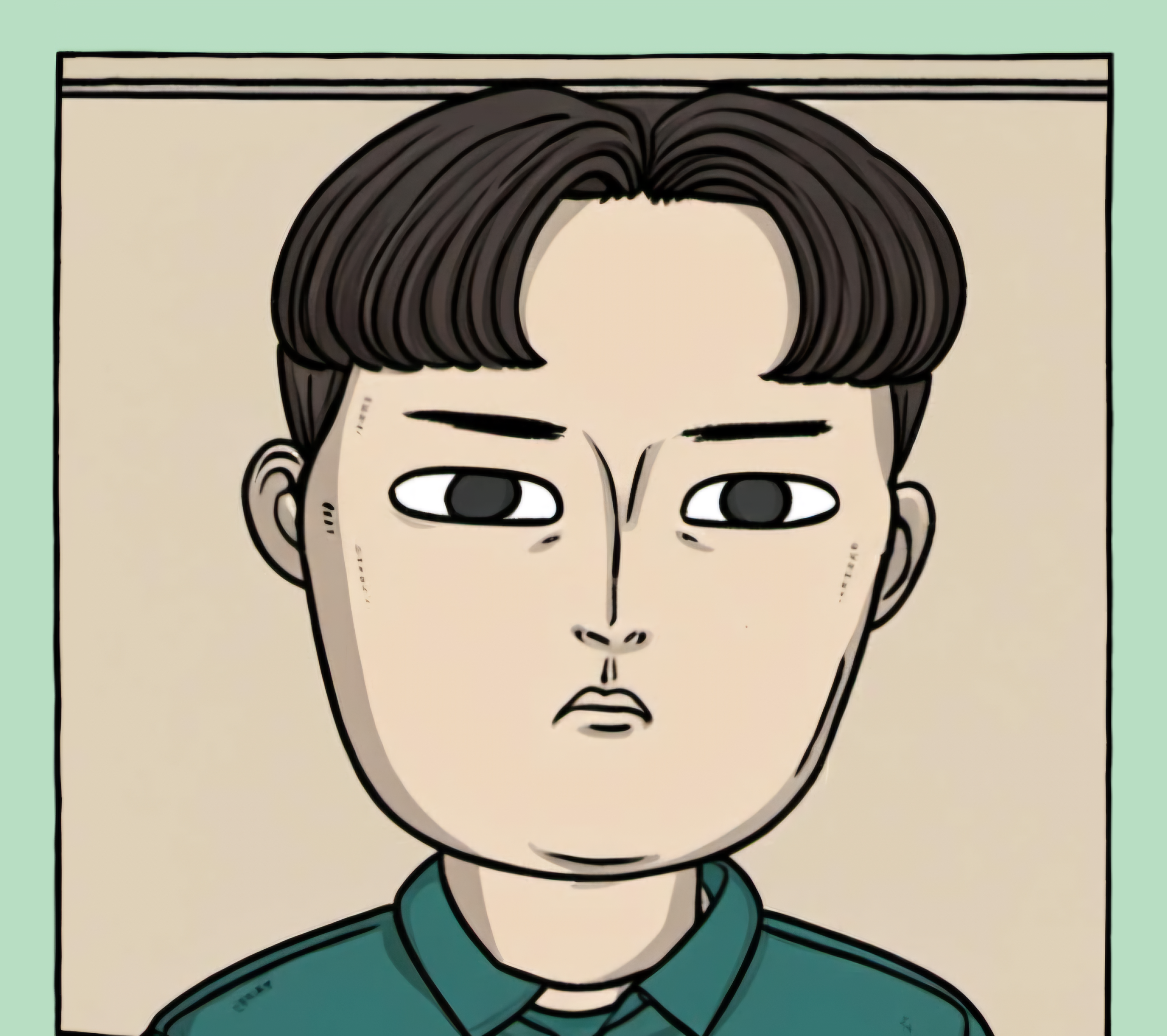1. SDV?
요즘 자동차 산업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 있다. 바로 SDV(Software-Defined Vehicle) 즉,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다. 단순히 ‘자동차에도 SW가 들어간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SW가 자동차의 핵심을 이끄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가. SDV, 무엇이 다른가?
기존의 자동차는 HW 중심이다. 즉, 기계적 부품이 핵심이고, SW는 단지 그것을 보조하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SDV는, 차량의 동작을 SW가 관리하고, 기능을 SW로 추가하거나 확장하며, 새로운 기능을 온라인 업데이트(OTA)로 적용할 수 있다.
즉, 자동차가 마치 스마트폰처럼 SW 업데이트를 통해 점점 똑똑해진다고 보면 된다.
나. SDV가 다루는 범위
① 안전
- 브레이크, 조향 시스템
② 편의성 증대
- 라디오, 실내 조명, 공조 시스템 등
편의성 및 안전이 중요한 영역까지도 SW가 담당하게 되니,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는 SDV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 SDV가 왜 필요한가?
지금까지의 자동차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고급 차량에는 100개 이상의 ECU(Electronic Control Unit)가 들어가고, 이 각각이 특정 기능을 담당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많은 제조사들이 여전히 SW와 HW를 강하게 결합하고 있다. 각 ECU는 전담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어, 기능 확장이 어렵고 유연하지 못하다.
무엇보다 SW 업데이트 자체가 어렵고 불편하다. 이 구조는 곧, 고객에게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싶어도 시스템 구조가 발목을 잡는 상황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SDV가 필요하다. SDV는 이 모든 문제를 정면 돌파한다. 기능은 HW가 아니라 SW 중심으로 설계되고, OTA로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고, 차량이 출고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능이 확장된다. 즉, 자동차가 단순한 ‘완성품’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라. 스마트폰으로 SDV 이해하기
2009년, NOKIA는 총 57개의 서로 호환되지 않는 OS 버전을 만들었다. 그만큼 기기 간 연동이 어려웠고, 유지보수도 악몽이었다. 결국, NOKIA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
기존 자동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조 시점에 HW와 SW가 정해지고, 차량 출고 후에는 기능 확장이 거의 불가능하며, 업데이트는 정비소에 가야만 가능했다. 이런 차량은 한 번 팔리고 나면 가치가 고정된 2G 폰과 비슷하다.
반면, SDV는 스마트폰처럼 진화한다. SDV는 ‘출고 후가 더 중요한 차’이다. SW를 통해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거나 최적화할 수 있고, 유저가 일부 설정을 직접 변경하거나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으며, 보안 패치, 자율주행 알고리즘, 커넥티비티 기능 등도 OTA 업데이트로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마. 자동차는 더 이상 '완성품'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전자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SDV는 단순히 기술 하나의 변화가 아니다. 자동차 산업 전체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마력, 토크같은 기계적 요소가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ADAS, 인포테인먼트, 커넥티비티 같은 SW 요소가 핵심이다. 이러한 SW 중심 아키텍처가 있어야만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V2X 같은 최신 기술이 가능해진다.
궁극적으로 SDV는 기계 장치에서 지능형 확장형 전자기기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기존에는 고정된 기능만 수행하던 차량이, 이제는 마치 스마트폰처럼 앱 기반 기능 확장과 SW 업데이트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SDV가 가능하려면 HW의 표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차량 모델에서 같은 SW가 작동하려면, 일정 수준의 HW 일관성과 플랫폼 구조가 필요하다.
바. SDV가 주는 이점
1) HW의 표준화 필요
① 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
- 컨테이너 기반 absraction으로 유지보수가 쉬워짐
② 이식성(Portability)
- 표준화된 HW 덕분에, 여러 모델 간 SW 재사용 가능
③ 생산성(Developer Productivity)
- 일관된 플랫폼 덕에 개발 난이도 및 비용 감소
2) OTA(Over-The-Air)
① 보안 & 편의 기능의 지속적 개선
- 보안 패치의 정기적인 제공
-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최신 상태로 유지
- 심지어 파워트레인, 차량 동역학까지 원격으로 튜닝 가능
② 유지보수 간편화
- 리콜이 필요할 때, OTA로 대응 가능
③ 모델 리프레시 필요성 감소
- 같은 HW라도 SW만 바꿔도 성능이 향상되므로 신차를 자주 바꿀 필요 없음
④ 새로운 기능의 빠른 배포
- 새로운 기능을 OTA로 빠르게 전송해 고객에게 즉시 제공 가능
- 이로 인해 user experience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차량의 시장 가치는 높아짐
⑤ 차량 진단 & 수명 주기 관리
- 차량 데이터를 수집해 정밀 진단 및 예방 정비 가능
- 제조사(OEM)는 이를 바탕으로 수익 창출 모델까지 설계 가능
사. Tesla의 SDV 사례
1) Example 1
2017년 허리케인이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했을 당시, Tesla는 OTA로 Model S와 X의 60kWh 배터리를 일시적으로 75kWh로 업그레이드했다. 이는 대피가 필요한 운전자들에게 추가 주행거리를 무료로 제공한 인도적 조치였다.
2) Example 2: 일상적인 OTA 활용
- FSD(Full Self Driving) 기능
- 카메라 및 배터리 시스템
- 회생 제동 시스템
- 인포테인먼트 SW
이처럼 차량의 대부분 기능이 클라우드를 통해 유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2. Requirement for SDV Design
가. Zonal EE Architecture
SDV의 HW 아키텍처는 ‘Zonal EE Architecture’로 대표된다. 이는 차량 내부를 몇 개의 zone으로 나누고, 각 zone에 독립적인 전자 제어 유닛(ECU)을 두는 구조이다.
1) Central Computer(Vehicle Computer)
차량 전체의 센서 데이터를 종합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며,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연산 능력과 유연성을 요구한다. 이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등 고급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2) Zonal ECU
각 zone의 센서나 액추에이터와 직접 연결되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말 그대로 지역 거점 역할이다.
나. SW Architecture
1)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란?
SDV의 SW는 다양한 기능을 빠르게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SOA이다. 서비스 간의 독립성과 재사용성을 보장하며, 서로 다른 플랫폼이나 언어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즉, 기능별로 쪼개진 작은 서비스들이 모여 전체 차량 시스템을 구성한다.
2) Vehicle OS
HW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SW 플랫폼이다. SDV는 다음과 같은 OS 스택을 필요로 한다.
- Bootloader, Hypervisor, Device Driver
- 다양한 OS (Linux, RTOS, Android 등)
- AUTOSAR (classic, adaptive 등) 기반 미들웨어
- 가상 머신, 컨테이너, 클라우드 연동 기능 등
이처럼 Vehicle OS는 일반적인 IT 시스템 못지않은 복잡성과 확장성을 요구한다.
다. DevOps의 도입
SDV는 기존 차량보다 SW의 업데이트 빈도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개발-배포-운영을 빠르게 순환시키는 DevOps가 필수적이다.
라. OTA (Over-The-Air)
OTA는 차량을 서비스 센터에 가지 않고도 기능 개선이나 버그 수정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이는 SDV의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기능 확장성’의 핵심 기반이다.
마. V2X: 통신 인프라
마지막으로 SDV는 단순히 차량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 환경과의 연결도 요구한다. V2X(Vehicle-to-Everything) 통신 기술은 다음을 포함한다.
- V2V (차량 간 통신)
- V2I (인프라와 통신)
- V2N (네트워크와 통신)
- V2P (보행자와 통신)
<참고 자료>
전재욱 교수님, SDV 이해하기(K-MOOC),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24.12.09.~'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