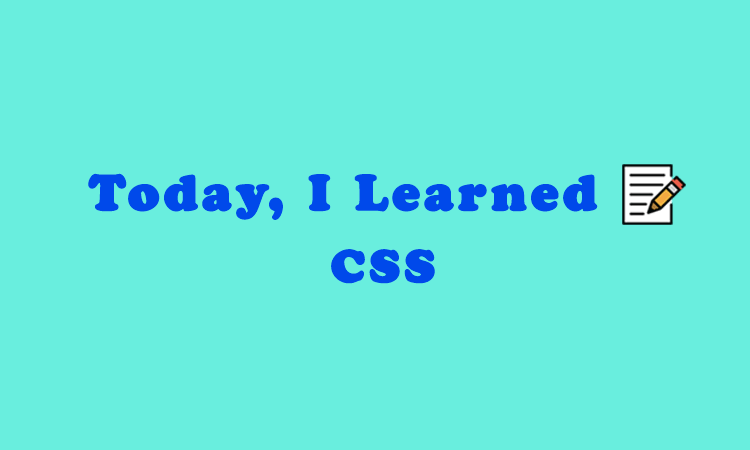
em
em 이라는 것은 부모의 폰트 사이즈에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계산 되어 짐
.parent{
font-size : 8em; //16px*8
}
.child{
font-size : 0.5em; // 16p*8*0.5
}v 기본적으로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브라우저에 저장된 폰트 사이즈는 html에 16px로 지정되어 있음
parent에 8em이라는 것은 이 parent 부모 요소인 HTML의 16px의 8배가 곱해진 값 16px*8=128px
이 parent안에 있는 child는 차일드의 부모인 parent의 0.5배가 계산되어진 64px이 브라우저에 표기가 됨
즉, parent는 800%, child는 50% 값
<div class="level1">
<h1>level 1</h1>
<div class ="level2">
<h1>level2</h2>
<div class = "level3">
<h1>level3</h1>
</div>
</div>
</div>.level1{
font-size : 2em; //16px*2
}
.level3{
font-size : 2em; //(16Px*2)*2
}
.level3{
font-size : 2em; //(16Px*2*2)*2
}
rem
root를 나타내닌 r.
em: relative to parent element
rem: relative to root element
루트에 지정된 폰트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됨
parent는 16px8=128px
html의 최고의 루트인 16px에 곱해짐 16px0.5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 font-size : 100%로 지정되어 있으나, 만약 고정된 픽셀 값을 루트에서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반응형이 되지 않음
.level1{
font-size : 2rem; //16px*2
}
.level3{
font-size : 2rem; //16px*2
}
.level3{
font-size : 2rem; //16px*2 root 16px에 *2한 고정값
}rem이 직관적으로 수정하기도 좋고 보기에도 편하다는 점.
패딩사이즈 또한 em 값으로 줄 수 있음. padding : 1em;
컨테이너 자체 사이즈를 만들 때는 em과 rem은 반응형 유닛이긴 하지만 폰트 사이즈에 비례해서 변하기 때문에 결국 고정적인 값을 가짐. 컨텐츠를 조금 더 유동적으로 반들기 위해서는 %를 쓰는 게 좋음.
em과 rem은 디자인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쓰이는 것뿐 어떤게 더 좋다는 건 없음!
ABSOLUTE : px
Relative : % em rem v*
💡 How can I use them in a proper way?
-
부모 요소의 사이즈에 따라서 사이즈가 변경이 되야할 때, %나 em
부모와 상관없이 브라우저 사이즈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면 v*나 rem -
요소의 너비와 높이에 따라 사이즈가 변경이 되야 한다면 %나 v*
폰트 사이즈에 따라 사이즈가 변경이 되어야한다면 em나 r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