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츠스케일링을 읽어보고
회사 숙제로 읽어본 책에 대한 독후감을 두서없이 적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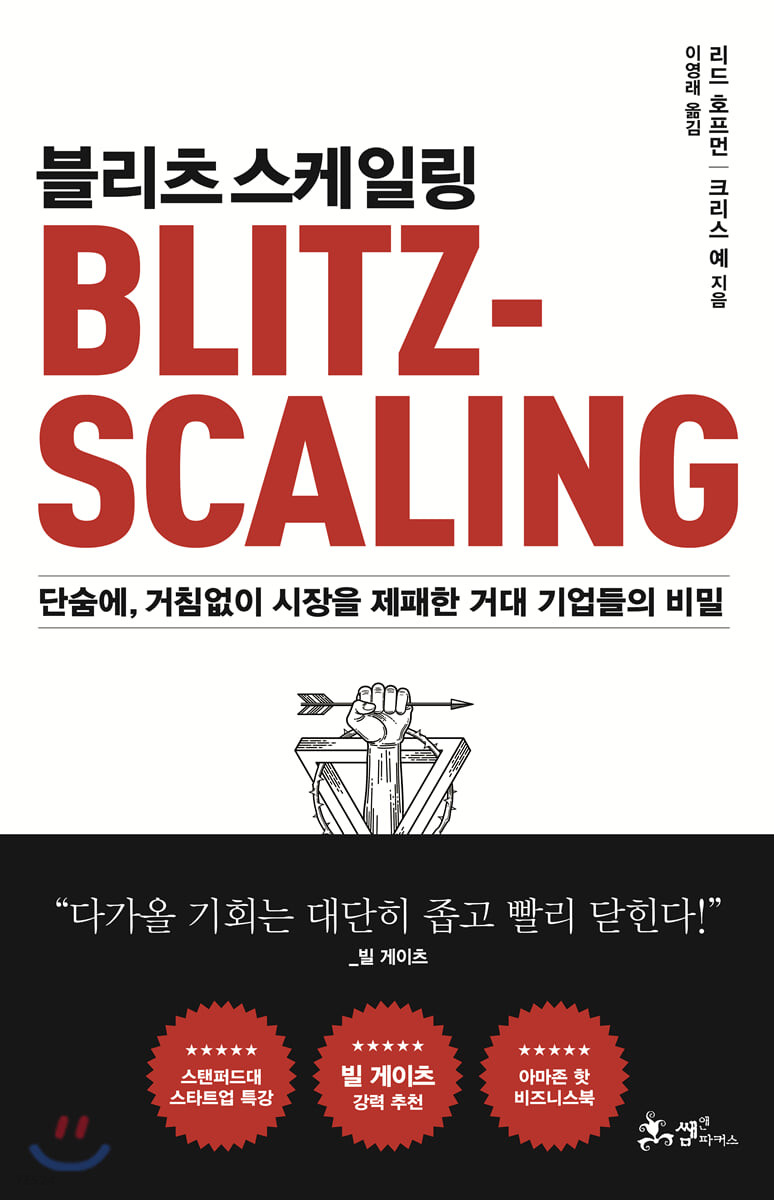
느낀점
-
블릿츠스케일은 거의 모든 훌륭한 사업전략과 관련이 있는 요술지팡이처럼 설명이된다. 하지만 닷컴버블 이후 저금리 기조에서나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21년 코로나 버블 이후 시장은 고금리 기조가 앞으로 장기간 유지될 것이고 이 시기에 스타트업은 성장보단 이익 관련 KPI를 강요받는다. 더욱이 투자 자금 확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오롯이 성장에만 집중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전략을 유지해온것처럼 보이는 뱅크샐러드나 리멤버 같은 회사는 구조조정을 해야만하고 그보다 더 이익을 고민하지 않는 회사들은 진작 파산했다.
-
사실 저금리에 유동성이 풍부한 시절 이 성장을 경험해본 것 같다. 재직했던 숨고는 거의 이러한 과정으로 성장했으며 당시 Growth에 미친 스타트업들은 전부다 블릿츠스케일 전략을 충실히 고수했다. 그땐 이러한 사업전략을 정확히 설명하는 고유명사를 몰라서 DDD와 Growth라는 깃발을 꼽고 달렸던 것 같다. 이제와보니 이것이 블릿츠스케일.
-
엔지니어가 블릿츠스케일을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은 AA(Acquisition과 Activation)을 위해 당장의 기술부채를 용인하는 것이다. 아니면 AA를 위해 기술부채를 쌓는것도 맞을 수 있다.
-
블릿츠스케일은 속도를 위해 효율을 희생하는데 이게 반드시 반비례되는 관계인지는 모르겠다. 내 생각엔 이건 트레이드오프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일 수 있다. 효율을 추구하여 속도를 개선. 대체로 간단한 업무방식의 효율화는 반영구적인 속도 개선을 야기한다. 이 책에 의존하여 우리가 효율을 묵인하는 근거로 사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류의 책이 늘 그랬던 것처럼..
-
모든 스타트업이 블릿츠 스케일로 성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리스크:테이킹을 어떻게 분배할지 관점에서 블릿츠스케일은 리스크와 테이킹을 극대화하는 관점인데 사례로 나온 에어비엔비, 페이팔 같은 빅텍들과 다르게 99%의 실패한 회사가 있을 것 같다. 다른 전략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낮게 유지해서 적당히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유지해도 괜찮지 않은가? 적어도 가치투자 관점에선 돈을 잃지 않는것, 시장에 오래남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리스크와 테이킹을 낮게 유지하는것이 허접한 전략, 용감하지 않은 전략처럼 보이는게 우려가 된다. 리스크와 테이킹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 블릿츠 스케일과 반대되는 전략을 그로스 스케일 이라고 보는데 당장 이러한 전략으로 성공한 회사를 리서치해도 적잖게 나온다. (예를 들면 애플과 통신 회사들)
-
성장 자체가 수익을 발생하는 것은 어느정도 사실이라고본다. 성장 역시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할 전략일 수 있다.
-
페이팔에서 결제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청구하지 않은 사례는 숨고에서 안전결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과 사례가 비슷하다. 성장을 위해 이익을 희생하는것인데 이는 새로운 BM 출시 후 초반에만 유효할 듯 싶다. 이러한 전략을 종료할 시점과 고객에게 비용을 아주 자연스럽게 온보딩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
네트워크 효과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단순히 커뮤니티 피쳐를 런칭했다고 네트워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진 않다. 결국 이 플랫폼 내에서 높은 활성도를 유지해야하는 당위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파워 유저들 중심으로 네트워킹이 생기면 되는것인지? 이를 가장 잘하는게 게임인 것 같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어주니 길드 같은 네트워킝 도메인은 자연스럽게 유지되었던 것 같다.
-
타운홀 미팅은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들이 가이드 되었는데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 이 시간에 모든 팀의 KPI를 리뷰 한다던지, 별 내용없는 공유만 몇개 있다던지, 의제가 부족한데 억지로 만들어서 안해도 되는 타운홀을 한다던지 과거에 아쉬운 경험이 너무 많다. 이 시간은 전사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 팀의 KPI는 탑 리더십만 논의를하거나 각 팀별로 위임을 해도 괜찮지 않은가!
-
CEO 마이크로 매니징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나온다. 요즘엔 마이크로 매니징이 어느정도 부정적인 뉘앙스로 여겨지는데 이는 구성원 관점, 즉 매니징을 받는 당사자 관점에서의 논리가 주요하다. 이 책에선 CEO가 마이크로 매니징 따위에 시간을 활용하는게 ROI가 안나온다는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것 역시 동의가 된다. 매니징의 양 주체 모두를 근거로 마이크로 매니징은 그 자체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
게임을 만들때 당시 PD는 넷플릭스의 헤이스팅스의 과오와 비슷한 과오를 저질렀다. 본업(게임기획)만 추구한 나머지 클라이언트 미팅, 자기계발, 출장, 운동, 네트워킹을 등한시 했는데 그의 언행에서부터 이런 뉘앙스가 가득했다. 본업만이 구원이라는 그의 논리는 우리를 오롯이 본업에만 집중하게하는 FIxed Mindset에 어느정도 기여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자기계발만 추구하는것도 이상하다. 다시 고민해보지만 리더십은 균형감(6각형 인재)이 탁월해야한다.
-
블릿츠 스케일은 일종에 건축 설계도 없이 일단 집을 짓자는 전략인데 특별히 엔지니어 직군에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은 늘 준비된 설계와 빠짐없는 엣지케이스 목록을 원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블릿츠 스케일의 결과로 나타날 아름다운 결과로만 동기부여한다해도 부족할 수 있다. 엔지니어는 미래보단 현재 내가 어떤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직군이기 때문이다.
-
성장 전략을 위해 고객을 무시하는 접근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 적어도 B2B SaaS에서 이것은 사업을 내던지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B2B의 세일즈는 철저히 구매담당자와 유저 관점에서 퍼소나를 설정하여 전략을 구축하는것이 상식이고 시중에 성공한 SaaS 역시 이러한 전략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전 회사인 레몬베이스는 이를 가장 잘 수 행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VoC를 외면하며 우리가 얻은 뼈아픈 실패를 생각하면 이 슬로건은 너무나 위험하다. B2C더라도 이것이 작용하는 환경은 정량적 데이터가 보여주는 방향과 VoC가 상반될때를 가정해야할 것 같다. 대체로 일치하는 정량적 데이터와 VoC일지라도 어느순간엔 모순을 보여주는데 그땐 통상 데이터가 올바른 방향을 제안했던 것 같다.
-
일관된 문화가 중요하다. 그것이 강하거나 약하거나가 중요하기보단 우리가 지닌 문화가 얼마나 일관되어있는지 그러한 스타일에 조직 구성원이 얼마나 잘 융화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반드시 이 문화에 동조해야만 좋은 것이라고 낙인찍는것은 너무 위험하다. 어떠한 문화적인 기조에서 우리가 다양성을 충분히 존중하는지도 좋은 문화를 가졌는지에 대한 척도 일 수 있을 것 같다.
-
기술부채와 다양성의 부채에 대한 비유는 살짝 와 닿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