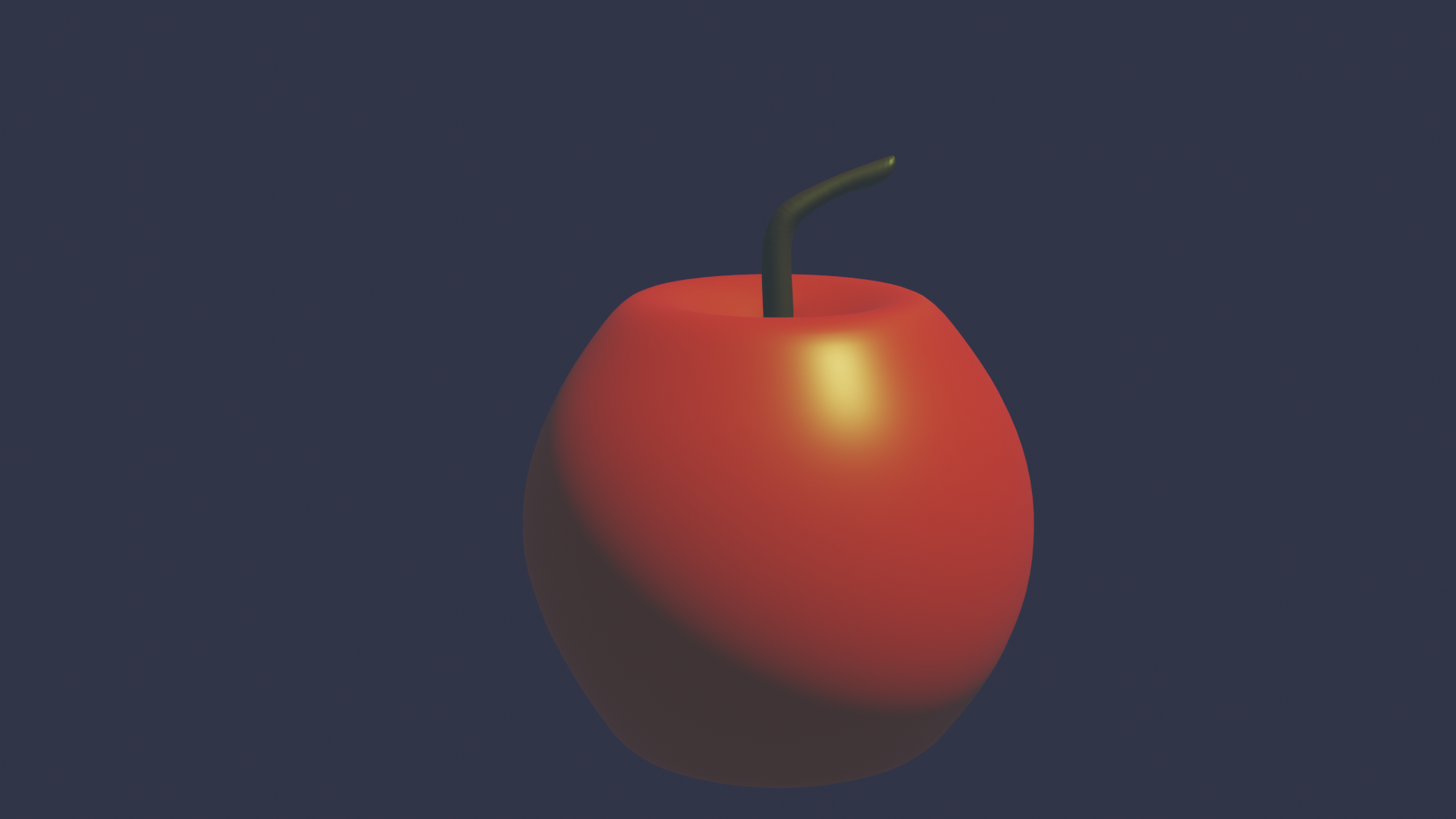원래는 이곳에 경험담같은 건 안 적으려고 했다. 되도록 내가 신기해했던 것들을 위주로 정말 특별한 것들만 적을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 이 블로그를 잊게 되는 거 같아서 이제는 경험담도 적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그러라고 있는 게 카테고리 아니겠는가.
파란만장했던 졸업작품도 끝났고 한이음 ICT 공모전도 12월에 입선 상장(?)을 받는 걸로 끝날테니 슬슬 취직을 준비해야 했다. 이제보니 블로그에서 존댓말과 반말을 오가며 글을 적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반말을 찍찍 적고 있었다. 밤 12시가 넘어가서 그런지 지금 내가 정신이 없지만, 정말 지저분한 글을 적고 있지만, IT 기술 블로그란 원래 그런 것이 아닐까.
아마도 정신이 멀쩡해진 나는 이 글을 읽고 처참한 글솜씨에 절망할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게 맞춤법 검사기도 안 돌렸다.

요즘 트랜드가 서론을 빼버린 본론 위주의 글쓰기라고 한다. 바쁜 현대 사회는 이해하지만, 난 그런 글쓰기가 싫다. 서론만 주구장창말하는 건 대화에서 거슬리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습관이라고 하지만, 작문은 원래 그런 매력이 있기 마련인데 효율이 낭만을 굶겨 죽였다. 요즘 인터넷 소설은 사이다니 뭐니 해서 암시도 빼버리고 이야기 빌딩 과정도 고구마라며 좋아하질 않는다. 슬프다.
그래서 결론만 말하고자 한다. 한이음 ICT 공모전은 입선했다. 멘토님께서는 동상도 가능했을 거 같았다고 말씀하셨지만, 난 간밤마다 괜시리 공모전 상금 리스트를 보며 금상, 수상, 은상은 아니어도 동상을 남몰래 원했기에 소식을 듣고 분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물론, 지금은 결과가 이해가 간다. 여행 앱이라는 기획은 좋았으나, 여행 앱 특성상, 데이터베이스에 쌓인 데이터가 승부를 가르는 시장의 API 값은 대학생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컸다. 수많은 외부 API, 덕지덕지 붙은 지적재산권, 구글 광고에 의존하는 수입. 앱을 출시했다면 금방 적자에 시달릴 운명이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여행앱을 계획했을 때 수익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 아무리 여행이 그 당시 좋은 주제라고 해도 수익 구조가 없는 앱을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난 이제 이 질문의 답이 입선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한이음 ICT 멘토링을 통해서 배운 점도 많았다. 예를 들면 이번에 만난 멘토님의 조언이었다.
Retrofit2은 call을 어댑터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드로이드 공식 문서로 독학 해온 거나 마찬가지인 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약간 멍했다. 정말로 모든 응답마다 코드를 작성 중이었고 그로인해 통신 부분에서 불필요한 코드가 굉장히 많았다.
한 번에 응답을 다루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난 이미 Interceptor의 존재도 겨우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방법을 몰랐다. 사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이미 만들어져있는지도 몰랐다. 괜히 어댑터를 만들 시도를 구상하고 있었던 거 같다.
내 스타일이 volley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옛날 스타일이라고 한다. volley는 이름만 들어보고 Retrofit2도 간단한 조작만 읽고 곧바로 투입되었던 기억은 있다. 그리고서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 이런 독특한 스타일이 완성된 게 아닌가 싶다.
사실 좋게 말하면 독특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게으르게 공부했다는 것이다.
안드로이드 하기 전에 맨날 소켓 통신만 보고 하던 내게 Retrofit2의 기본 형태는 엄청난 편리함이었기에 그런 불편함을 덜 느꼈던 거 같기도 하다.
솔직히 너무 편리했다. 그래서 더 편리한 방법이 있다는 걸 인지 못 했던 걸지도 모른다. 결국에 공부를 게으르게한 핑계를 말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너무 편리했다.
그것도 그렇고 멘토님께서는 굉장히 친절하셨다. 취직에 대한 조언도 꾸준히 해주셨고 (하지만, 내가 그걸 따랐던 적은 별로 없는 거 같다. 게으름 +1) 디자인 시에 앱의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다. (하지만, 그 흐름을 내가 잘 구현 못 했던 거 같다.)
안드로이드 앱과 앱 디자인을 혼자서 맡고 서버 담당자가 두 명이었는데 시작할 때는 내가 그 일을 해내는 게 가능할 거 같았다. 보고서도 내가 쓰고 디자인도 내가 하고 앱도 만들고 테스트하고. 하지만, 현실은 인간은 그렇게까지 멀티를 못한다는 씁쓸한 결과였다.
솔직히 마감일 직전에 서버에서 기능이 몰려오면 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4시간 자면 행운. 그렇지만, 누구에게 탓할 수도 없는 게 내가 하겠다고 했으니 책임질 수 밖에 없었다. 결정적으로 졸업작품 최종 심사에 내가 늦잠을 자고 데모 앱을 못 가져올 뻔한 일도 발생했었다. 팀원분께서 깨워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음부터는 일의 진행을 위해서라도 적당히 적당한 일만 맡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번 일로 Figma와 굉장히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한다. ACK 2024에 수상은 아니어도 논문이 게재되고 당연하게도 논문 포스터를 준비했는데.
Figma는 여기서도 활약했다. 논문 포스터를 직접 디자인하면서 처음 구상한 파랑 베이스에 보라색과 노란색을 섞은 몽환적 이미지의 배경색은 CMYK 이슈로 쓰지 못했지만, 단단한 느낌의 파랑 베이스 디자인으로 급하게 선회할 수는 있었다.
Figma와 친해진 이후로는 포토샵과는 멀어진 거 같지만, 뭐 어떤가. 난 디자이너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