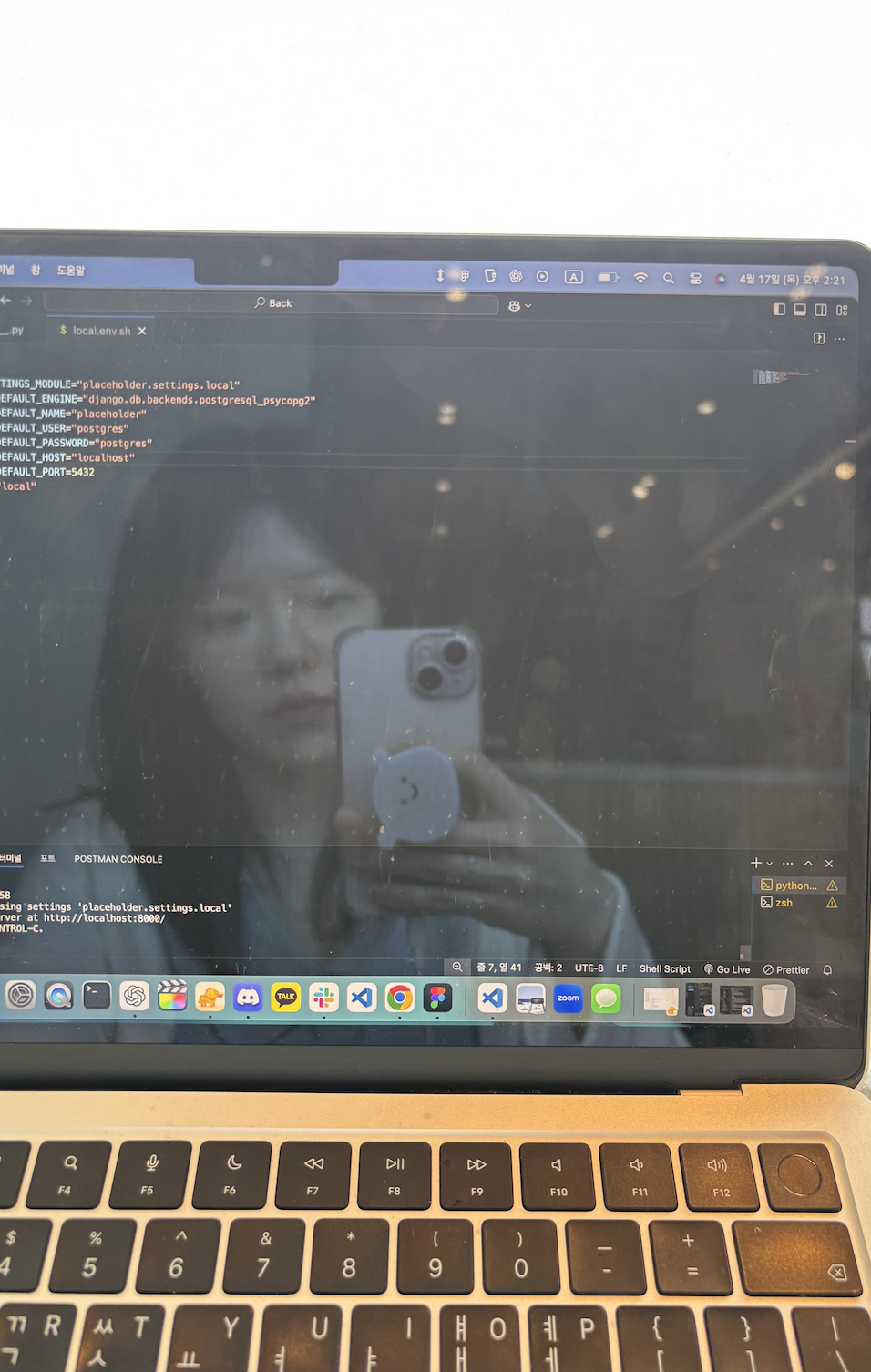취업했다고 친구가 옷을 10만원어치 사주었어요.
출근할 때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옷을 꼭 본인이 선물해주고 싶다고.
먼지가 가득한 매장에서 두 종류의 바지를 각각 3가지 색, 2가지 사이즈로 갈아입어보는 동안 연신 재채기를 하면서도 제 가방과 겉옷을 들고 착용샷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선이 편안했습니다.
귀가하기 전 지하철 역에서 무심코 '우리 회사'라고 말을 내뱉은 뒤, '와, 우리 회사라니!'라며 까부는 저를 보더니, 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어요. 너무 좋다고.
친구에게 고마운 감정은 그저 당연하고 굉장히 크고 그래서 빨리 소화해내지 못한 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일까요, 뇌가 다른 케이스를 끌어들여 어떤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economist impact의 PR 인터뷰를 준비하며 제가 준비한 답변 내용과 오늘의 만감이 엮여, 하나의 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을 얼굴로, 피부색으로, 체형으로, 직업으로, 학벌로, 성별로, 출신지 등등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결론내리는 것은 너무나 게으르고 오만한 행동이라고. 이것이 비만과 그 인식에 대한 다큐지만 결국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조금 더 날을 세워 부지런히 그를 알아가도록 노력하느냐의 문제라고. 그런 이야기를 써뒀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어떻게 가까운 이들을 대하고 있었나 반성하게 된 오늘이었죠. 자칭 남미새라는 자조적 농담을 방패 삼아, 내 마음과 돈과 시간과 체력을 무의미한 이에게 쏟고 정작 기존에 받아오던 진심과 사랑은 당연시했더군요.
뚱뚱해서 게으를 거야, 노력을 안 해서 연봉이 낮지 따위의 말로 사람을 평가한다거나 헬스트레이너는 믿으면 안 돼, 영업직원은 다 가식이야 따위의 생각으로 어떤 인연을 단정지은 적은 없(다고 믿)지만, 저 역시 다른 의미에서 너무나도 게을렀어요. 인생의 동반자, 유일, 이성애자이므로 남성, 연애 아니면 결혼, 가족... 따위의 키워드에 얽매여 사고를 확장하는 일에 손을 놓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도, 인간관계에 대한 성찰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도 취업 준비 못지않게 열과 성을 다해 임했어야 하는 종류의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