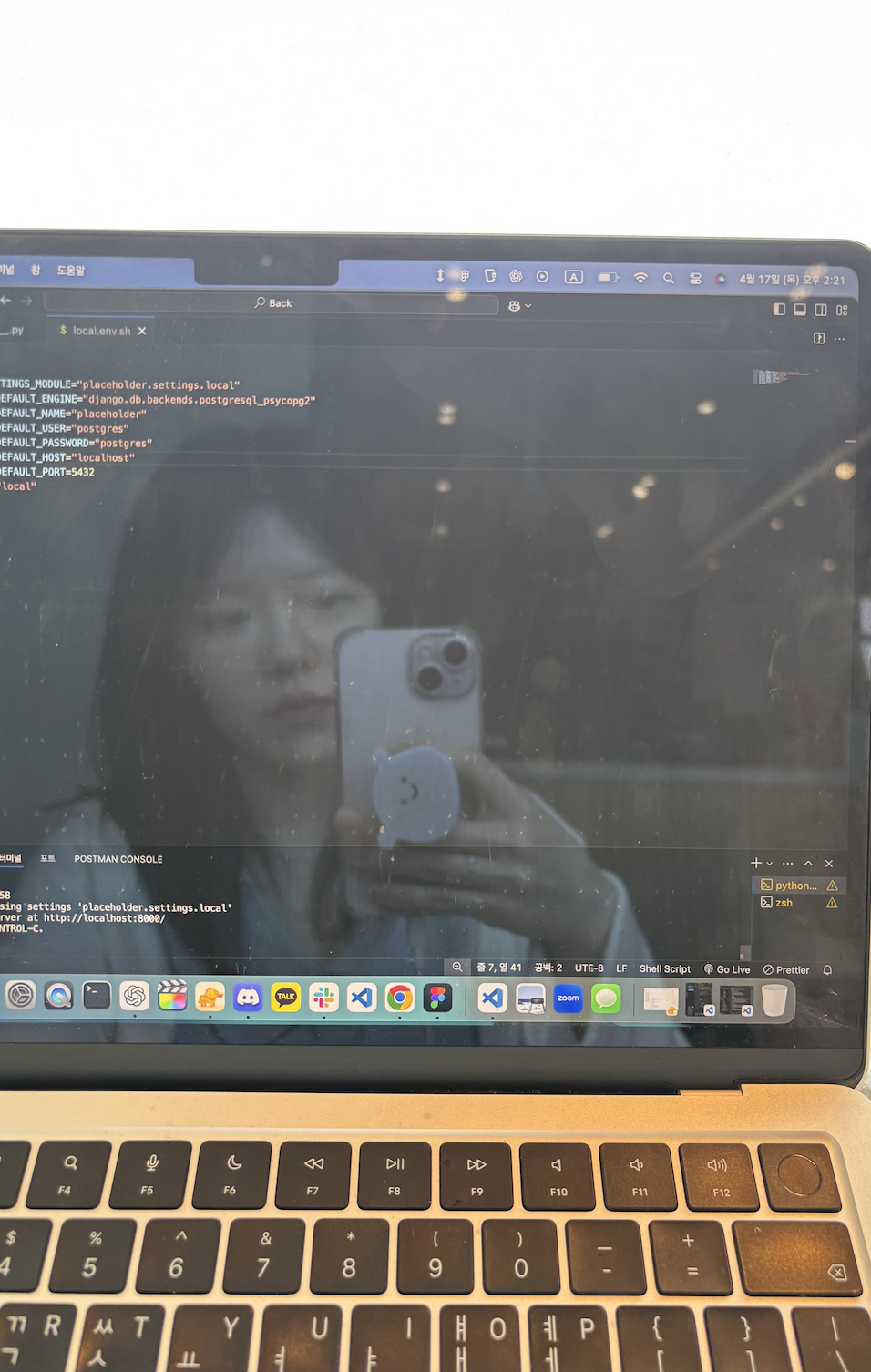매일 글쓰기 키워드를 띄워주는 '씀'을 받았다.
외부에서 보면 시시껄렁하기 짝이 없는 일상도, 경험도, 다 내게는 쉽지 않은 삶의 굴곡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와중에 가끔 쓰는 글은 내게 치유와 해소와 자기효능감의 시간으로 남았다. 사실 최근 모 에세이를 읽다가 블로그에 10년 넘게 쓴 글을 누군가가 발견해 책을 내고 작가로서의 삶도 살고 있다는 작가 분 감동 실화에 탐욕이 솟구쳤던 것이 가장 실질적인 계기.
그래서 스스로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해보기로 했다. 글쓰기로 검색해 보니 내가 원하는 목적에 부합해 보이는 어플이 바로 '씀'이었다. 물론 받고 나서 나흘이 지나도록 글은 쓰지 않았다. 언젠가는 이걸 활용해서 뭐라도 끄적이고, 기록을 남기자~! 미래의 내가 하고 있겠지? 하는 가능성의 시간은 참 보드랍고 달콤한 복숭아 같지(오늘 복숭아잼 이삭토스트 먹었다). 나흘 후 어플을 열고 키워드가 뜨는 순간, 열풍이 식을 줄 모르는(사실 식고 있는지도) 가챠샵의 도파민까지도 느껴졌으니 꽤 이득이다.
맨 처음 단어는 '계절'. 그리고 오늘 자 단어가 뜨기 직전에 보여졌다가 사라진 지난 키워드는 '꿈속에서'... 단어 제시가 이런 식이면 저는 가슴이 먹먹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계절 : 냄새, 특히 가을과 겨울의 냄새, 계절이 흘러가듯이, 너와 내가 보낸 어떤 계절,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또 돌아오는, 시월의 끝자락, 소중하고 힘든 사람들이 이 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다가오는 겨울은 내 최애 계절, 그리고 또 매서운 계절... 나는 이렇게 단어만으로 계절에 대해 늘어놓다가 울 수도 있는 사람이란 걸 스스로 알기에 그 무게에 짓눌려 계절을 회피했다.
꿈속에서 : 근데 꿈속에서가 나온다고? ('꿈'같은 단일 명사가 아니라 '꿈속에서'로 조사가 붙어 제시되는 점이 맘에 든다) 어젯밤 꿈속에서 나는 조승우와 학원 로맨스물을 찍었다. 근데 대개, 내 꿈 속 로맨스물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첫사랑처럼 상큼+파릇하거나 아예 농염함이 넘쳐흘러 끈적이거나 하는, 그 어떤 쪽도 아니다. (실속이 없다) 그냥... 서로 손을 꼬옥 잡고 있으면서 믿어주고 위로해주긔... 아니면 눈을 계속 바라보거나 포옹을 하거나 머리와 등을 쓰다듬고 그 온기를 계속 나누긔... 이게 뭐긔? 아무튼 '꿈속에서'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키워드였는데 다행히(?) 어제 저런 꿈을 꿔서 조승우 짱 사랑해요 어휴 목소리도 좋지 하고 경쾌하게 패스.
벌써 지친다. 오늘 꺼 시작도 안 했는데 세탁기 다 돌아갔고 피곤하다. 세계. 세계 여행. 나는 전세계를 누비(?!)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지금은 누비기까지는 좀 그렇고 한비야처럼 어느정도 국제적인 무대를 내 활동 반경으로 (관념적으로는) 상정하고 있다. 중3때 내 가슴을 뻐렁치게 한 한비야... 알고보니 이빨을 잘 까는 것이 가장 큰 무기이고 논란의 중심에도 많이 섰던 그... 하지만 나는 그를 영원히, 어느정도는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내 인생관 형성에 임팩트가 너무 컸거든. 아무튼 중3때 중국에 갔고 20대때 여행을 많이 다녔고 20대 후반 뉴질랜드 워홀, 만 나이 딱 30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어학연수 중이었으니 나에게 '세계'는 우선은 월드와이드의 세계다.
그런데 '세계'와 마주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었다. 나의 세계, 누군가의 세계, 사람 안에 들어있는 끝없는 우주에 관한 아득한 인상만이 나를 강타했다. 생각이, 말들이, 수욱, 마음 속에서 무작위로 융기했다. 그리고 마침 인강 듣기 싫고 면접 준비가 하기 싫었다. (세탁기는 다 돌아가버렸지만) 그래서 이렇게 두들기고 있다. (아무튼 개발자라는 타이틀의 이 개발(?) 블로그에 쓰기로 한다. 달리 쓸 곳이 없다. 완전히 폐쇄된 공간에 쓰자니 조금 서운하고 아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쓸 용기는 없다.)
귀에서 위이잉 이명이 들린다. 아, 체력 고갈이다.
다른 사람의 세계를 내 기준에 맞춰 재단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틀렸다. 그르다. 별로다. 구리다. 상종하기 싫다. 멍청하다. 그게 본인에게 편리한 방식이라는 부분은 납득이 가지만 죽을 때까지 이해를 못 할 듯하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나?)
20년 된 친구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있고, 그를 알아가는 과정이 매번 새롭고 즐겁다. 마치 식물을 키우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듯, 멈추지 않고 누군가의 세계를 더 알아가며 관계를 꾸준히 가꿀 수 있다는 얘기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먼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먹어 봐야 아느냐는 질문에 나는 아직도 찍어먹어 보겠다고 대답할 에너지가 남아있나 보다. 미친놈이네. 근데 또 그렇게 악질적인 사람들만 만난 것도 아니잖아...? 드라마퀸도 아니고?
그래서 너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음. 내가 겪은, 그 행위를 이해할 수 없는 최초의 인간은 (아마도) 아버지였는데, 그래도 저 '사람'도 '나름'의 '인격'이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저런 언행을 보이는 것이겠거니 하고 20년 넘는 세월을 보냈다. 이게 내가 인간을 보는 관점이다. 인간을, 때로는 인간 답지 않게 구는 인간을, 그래도 인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인간의 세계도, '아 저 사람 보나마나 ~겠네'라고 단정짓지 않는다. 두 가지 이야기를 섞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 한 인간을 독립된 주체적 개인으로 본다. 2. 그에 대해 (그리고 모든 삼라만상에 대해) 가능하면 단정 짓지 않는 것이 내 성향이다.
오, 쓰다보니 삼라만상이란 단어가 나왔고 이게 결국 세계이기도 하다.
누군가의 세계에 대해서 쓰고 싶어 하는 나 자신이 아직도 낯설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30대 초반에 느끼기 시작한 마음. 왜냐면 소망하면 절망하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그렇잖아요 삶이? (적어도 나의) 삶이 그렇게 흘러왔읍니다. 혼자여도 잘 살 때, 그때에야 '함께'의 진정한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어디선가 교육받아왔거든요. 아무튼 사실 내게 (거의) 일순위로 필요한 건 관계였음을 인정하긴 해야지.
나는 개발자 취준생이고, 내 지원서/자기소개서에는 개발을 통해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높아졌다는 말이 써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해상도가 높아졌다는 표현을 누군가가 이미 어디선가 썼었는데, 내가 사용할 때는 인지하지 못했었다. 다만 개발을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체험한 시간을 설명하기에 찰떡인 것 같아 나도 떠올리고 썼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