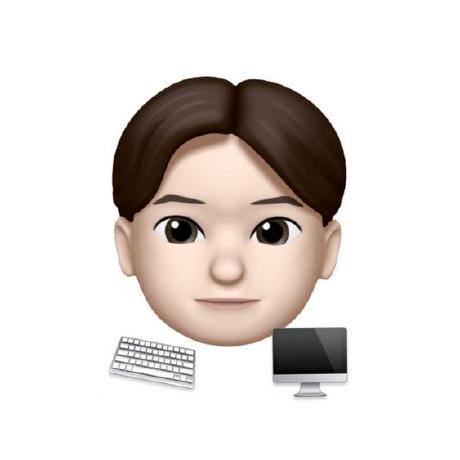📄 힙 영역의 메모리 공간 할당과 해제
malloc 함수를 이용하여 heap영역에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할당된 메모리 공간은 free 함수의 호출을 통해서 해제한다.
이를 통해 함수가 매번 호출될 때마다 할당되고, 또 함수를 빠져나가도 유지가 되는 생성과 소멸의 시기가 지역변수나 전역변수와는 다른 유형의 변수를 만들 수 있다 !
- malloc함수와 free함수의 기능
- malloc 함수는 인자로 전달된 정수 값에 해당하는 바이트 크기의 메모리 공간을 힙 영역에 할당하고,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할당된 메모리 공간의 첫번째 바이트의 주소값)을 반환한다.
- free 함수는 malloc 함수로 heap영역에 생성한 메모리를 해제한다.
- malloc 함수는 인자로 전달된 정수 값에 해당하는 바이트 크기의 메모리 공간을 힙 영역에 할당하고,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할당된 메모리 공간의 첫번째 바이트의 주소값)을 반환한다.
malloc함수와 free함수
Ex 1.
1. int main(void)
2. {
3. void * ptr1 = malloc(4);
4. void * ptr2 = malloc(12);
5. ...
6. free(ptr1);
7. free(ptr2);
8.
9. return 0;
10. }line 3 : malloc 함수 호출, 4 전달 -> heap 영역에 4byte를 할당하고, 첫번째 byte의 주소값을 void형 포인터변수 ptr1에 반환한다.
line 4 : malloc 함수 호출, 12 전달 -> heap 영역에 12byte를 할당하고, 첫번째 byte의 주소값을 void형 포인터변수 ptr1에 반환한다.
line 6 : ptr1을 인자로 하는 free 함수를 호출하여 생성한 4byte짜리 메모리 공간을 해제한다.
line 7 : ptr2를 인자로 하는 free 함수를 호출하여 생성한 4byte짜리 메모리 공간을 해제한다.
- ptr1을 void형 포인터로 선언한 이유
- malloc 함수의 반환형이 void형 포인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형 없이 메모리의 시작 주소값만 반환한다.
- void형 포인터의 특성
- 주소값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만능 상자이다.
- type 정보가 없기 때문에 포인터 연산(접근)이 불가능하다.
- 포인터 연산이 가능하게 하려면 형변환을 사용한다.
- void형 포인터의 특성
void * ptr1 = malloc(4) -> *ptr1 = 20; // 포인터 연산 불가능!
int * ptr1 = (int*)malloc(sizeof(int)); -> *ptr1 = 20; // 포인터 연산 가능 !malloc 함수의 반환형이 void형 포인터인 이유
malloc 함수의 일반적인 호출형태와 sizeof 연산 이후 실질적인 malloc의 호출을 보면 알 수 있다.
- malloc 함수의 일반적인 호출 형태
1) void * ptr1 = malloc(sizeof(int));
2) void * ptr2 = malloc(sizeof(double));
3) void * ptr3 = malloc(sizeof(int)*7;
4) void * ptr4 = malloc(sizeof(double)*9);- sizeof 연산 이후 실질적인 malloc 함수 호출
1) void * ptr1 = malloc(4);
2) void * ptr2 = malloc(8);
3) void * ptr3 = malloc(28);
4) void * ptr4 = malloc(72);결국 전달받은 바이트크기만큼 메모리를 할당하는 malloc함수 입장에서는 sizeof 연산 후 실질적으로는 달랑 숫자정보밖에 전달받지 못한다. 때문에, 할당하는 메모리의 용도가 int형인지, float형인지, char형 배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떄문에 어떤 주소값이든 담을 수 있는 void형 포인터로 반환한다.
malloc 함수는 원하는 크기만큼 heap영역에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그 메모리의 주소값(메모리의 첫 번째 byte의 주소값)을 void형 포인터로 반환한다.
따라서 프로그래머는 void형으로 반환되는 주소값을 원하는 type으로 적절히 형변환하여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접근해야 한다.
- 형 변환을한 malloc 함수의 호출 형태
1) int * ptr1 = (int*)malloc(sizeof(int));
2) double * ptr2 = (double*)malloc(sizeof(double));
3) int * ptr3 = (int*)malloc(sizeof(int)*7);
4) double * ptr4 = (double*)malloc(sizeof(double)*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