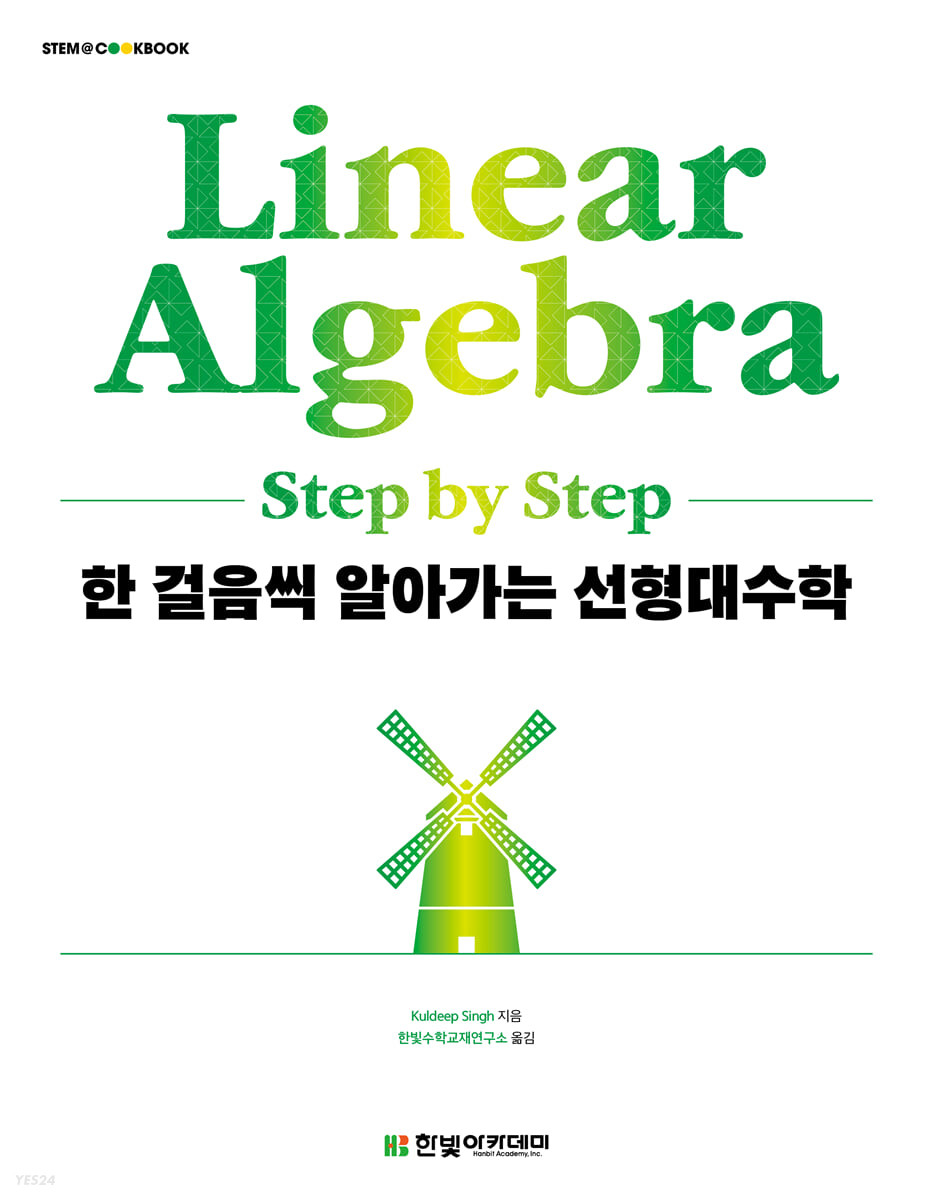
3.3 일차독립과 기저
일반 벡터공간에서의 일차독립
k1v1 + k2v2 ... knvn = O 일 때, 유일한 해 k1 = k2 = ... = kn = 0.
이들 중 어떤 것도 다른 벡터들의 일차결합으로 만들 수 없음.
(상수 배 안 됨)
... 일차종속
즈그들끼리 상수배로 표현 가능.
3.4 차원
차원
차원 = 기저벡터의 개수 == 기저집합 B의 원소의 갯수
표준 기저 벡터로 먼저 생각한 다음에 걔네들의 갯수를 세는 것이 쉽다.
3.5 행렬의 성질
행벡터
가로줄(행) 하나하나를 벡터로 표현한 것.
쉽게 말해 가로줄을 세로줄로 바꿔서 하나의 벡터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자.
ex)
-3 6
-5 2 -> r1 = (-3, 6)T, r2 = (-5, 2)T, r3 = (-2, 7)T
-2 7
행공간과 열공간
행공간 = 행벡터로 생성한 공간
열공간 = 열벡터로 생성한 공간
m x n 행렬이라고 했을 때,
행공간은 Rn의 부분공간이다.
열공간은 Rm의 부분공간이다.
-> 반대임에 주의하자.
행 사다리꼴 행렬의 행공간 기저
행렬 R이 행 사다리꼴 행렬이라면, 영행이 아닌 알짜배기 행들이 행렬 R의
행공간의 기저다.
-> 행동치(기본행렬을 곱해서 지지고 볶았더니 둘이 같은 행렬)이면 두 행렬의 행공간이 같은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A의 행공간의 기저를 찾으려면 기약행 사다리꼴 R로 바꿔서 R의 행공간의 기저를 찾자.
행렬의 계수(rank)
행계수 = 행공간의 차원
열계수 = 열공간의 차원
계수 = 행계수 or 열계수 (행계수 == 열계수 이므로)
-> 즉, 기약행 사다리꼴로 바꿨을 때 알짜배기 행들의 갯수가 곧 rank다.
-> 왜냐하면, 걔네가 곧 행공간의 기저니까.
3.6 연립일차방정식 다시보기
영공간과 퇴화차수
Ax = O를 만족하는 벡터 x의 해집합 N을 영공간이라고 함.
퇴화차수(nullity) = 영공간의 차원.
-> 0행이 나오면(선행 1이 모자르면) 자유변수가 생김. 그러면 x를 자유변수와 계수(다항식에서의 의미)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계수가 곧 벡터고, 자유변수가 곧 실수 = 스칼라로 볼 수도 있잖아.
-> 어? 그러면 kv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네?
-> 해집합으로 공간을 생성할 수 있게 됨. == 영공간
퇴화차수 = 자유변수의 갯수
-> nullity + rank = n
영공간의 성질
행렬의 열이 n개이면 영공간은 Rn의 부분공간이다.
-> 당연한 얘기.
왜냐하면, 해집합(x, y, z..)T은 세로로 표현하는 벡터니까, Ax를 했을 때, x의 원소의 수는 A의 열의 갯수에 대응하지.
가역행렬 동치 명제
- A가 가역행렬이다.
- rank(A) = n
- 행렬 A의 영공간은 영벡터만을 원소로 갖는다.
- nullity(A) = 0
- 행렬 A의 행벡터는 일차독립이다.
- 행렬 A의 열벡터는 일차독립이다.
5.2 선형변환의 핵과 치역
핵(kernel)
T: V -> W 선형변환에서
ker(T) 는 T(v) = O를 만족하는 V의 벡터집합.
-> 벡터집합이다. 어떤 숫자가 아니라.
-> T(v) = Av 라면 Av = O를 푸는 것과 같음.
핵의 성질
T: V -> W 선형변환에서 T의 핵은 V의 부분공간이다.
-> 공집합X, 합과 곱에 대하여 닫혀있다.
영공간과 퇴화차수
ker(T) = T의 영공간
ker(T)의 차원 = T의 퇴화차수(nullity)
-> ker(T) == 행렬 A의 영공간
치역(range)
T: V -> W 선형변환에서, w는 공역 W의 임의의 벡터라고 할 때, T(v) = w를 만족하는 벡터 v가 존재하는 w의 집합.
-> 얘도 집합이다. 그냥 정의역이 찔러서 나오는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자.
핵 = 정의역에 포함
치역 = 공역에 포함
-> 헷갈리지 말기.
치역의 성질
T: V -> W 선형변환. T의 치역은 W의 부분공간이다.
-> 공집합X, 합과 곱에 대하여 닫혀있다.
5.3 계수와 퇴화차수
선형변환의 계수(rank)
계수 = 치역 range(T)의 차원
-> rank(T) + nullity(T) = n(V의 차원)
치역의 성질
T: Rn -> Rn 선형변환이고, T(x) = Ax라면,
range(T)는 A의 열공간이다.
-> 부분공간도 아니고 열공간"이다".
range(T)의 기저를 구하세요
-> 열공간을 구하세요 -> 행렬 A를 전치하여 열을 행으로 바꾼 다음 기약행 사다리꼴을 만들어서 푸세요.
5.4 역변환
일대일 선형변환
u != v이면, T(u) != T(v)
대우,
T(u) == T(v)이면, u == v
일대일 선형변환의 성질
일대일 <=> ker(T) = {O}
->> nullity(T) = 0
위로의 선형변환
T : V -> W 선형변환에서, range(T) = W.
-> T의 치역과 공역이 같다.
-> rank(T) = dim(W)
(치역의 차원과 공역의 차원이 같다.)
문제 풀 때는 문제에 제사된 T : V -> W에서 W와 식을 푼 답의 차원을 비교하자.
일대일 선형변환과 위로의 선형변환
dim(V) = dim(W)면,
T는 일대일 선형변환 <=> 위로의 선형변환
-> 정의역과 공역이 같으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거나, 둘 다 아니거나.
T가 둘 다 만족한다. <=> ker(T) = {O}
== 전단사 변환
역변환
v = T-1(w) <=> T(v) = w
전단사일 때만 역변환이 존재한다.
이때 T를 가역이라고 한다.
문제 풀 때는 v의 x y 등으로 표현된 w를 a b 등으로 표현한 뒤 역으로 x y를 a b로 표현하자.
동형
T : V -> W가 가역이면, V W는 동형.
T는 동형사상.
동형임을 보인다.
1. 정의역과 공역의 차원이 같은지 확인한다. (dim(V) = dim(W))
2. T의 핵이 영벡터임을 증명한다. (ker(T) = {O})
5.5 선형변환의 행렬
변환행렬
[T(u)]C = A[u]B
이때 행렬 A를 변환행렬이라고 함.
A = ([T(v1)]C [T(v2)]C ... [T(vn)]C)
(v1, v2, ..., vn 은 V의 기저인 B)
5.6 역변환과 선형변환의 합성
선형변환 합성의 행렬 표현
[T(u)]C = A[u]B, [S(v)]D = B[v]C
[(S * T)(u)]D = BA[u]B
-> 가까운 거 먼저 계산하므로, A를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BA 순서임.
헷갈리지 말자.
가역변환과 가역행렬
T가 가역이다 <=> 변환 T를 나타내는 행렬 A는 가역행렬이다.
역변환과 역행렬
T: V -> V 일 때,
A가 V의 기저에 관한 변환 T를 나타내면,
A-1은 동일 기저에 관한 역변환 T-1을 나타내는 행렬임.
가역 선형연산자의 합성
T : V -> V와 S : V -> V가 가역 선형연산자면,
(S * T)-1 = T-1 * S-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