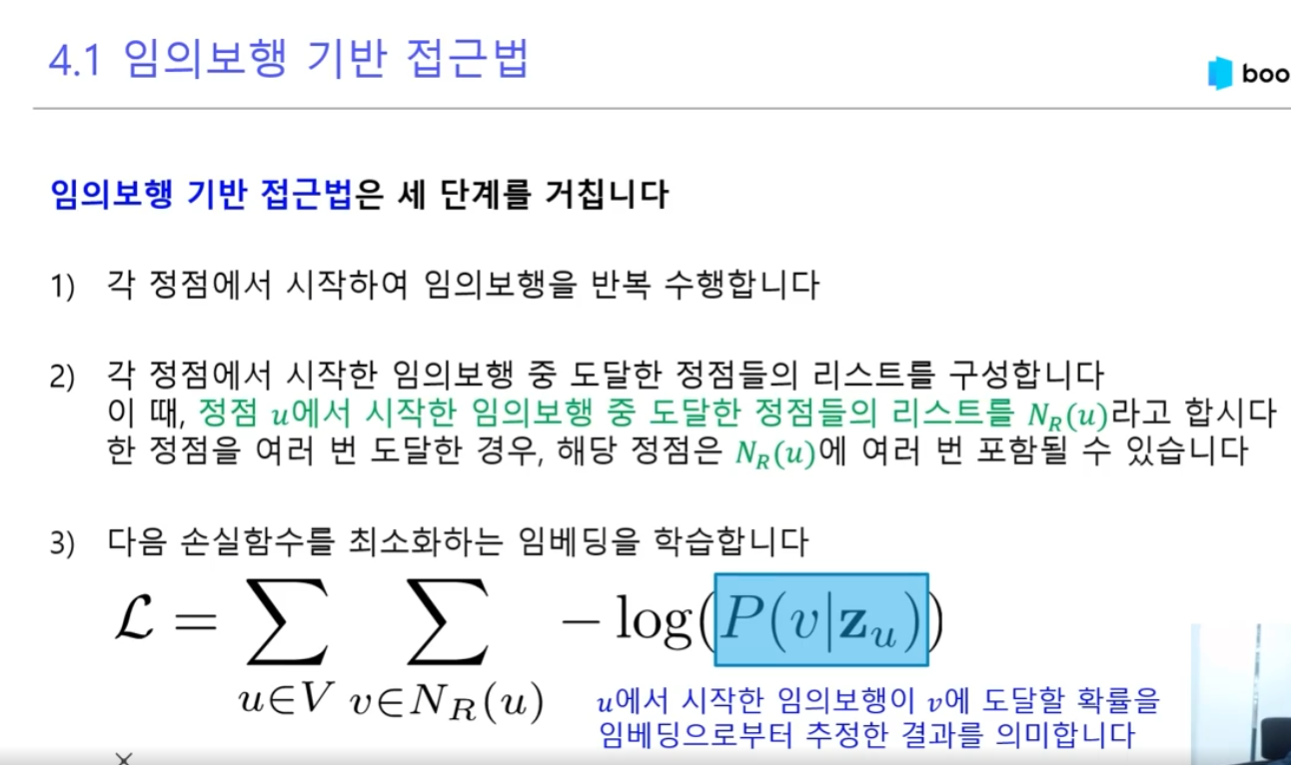
임의보행 기반 접근법의 손실 함수를 실제 예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네트워크 예시:
철수 - 영희 - 민수
| | |
지영 - 상우 - 동준- 임의보행 수행:
시작노드 '철수'에서의 임의보행 시퀀스 예:
R₁: 철수 → 영희 → 민수
R₂: 철수 → 지영 → 상우
R₃: 철수 → 영희 → 상우- 확률 계산 P(v|z_u):
철수의 임베딩 z_철수 = [0.8, 0.2]
영희의 임베딩 z_영희 = [0.7, 0.3]
민수의 임베딩 z_민수 = [0.5, 0.5]
P(영희|z_철수) = exp(z_철수 · z_영희) / Σ exp(z_철수 · z_w)
= exp(0.62) / [exp(0.62) + exp(0.4) + ...]- 손실 함수 상세 설명:
L = Σ Σ -log(P(v|z_u))
u∈V v∈N_R(u)여기서:
- V: 모든 노드 집합
- N_R(u): u에서 시작한 임의보행에서 방문한 이웃 노드들
- z_u: 노드 u의 임베딩 벡터
- P(v|z_u): u의 임베딩이 주어졌을 때 v로 이동할 확률
- 실제 계산 예시:
1단계: z_u · z_v 계산
철수→영희: 0.8×0.7 + 0.2×0.3 = 0.62
2단계: softmax 적용
P(영희|z_철수) = exp(0.62) / Σ exp(z_철수 · z_w)
3단계: 음의 로그 취하기
Loss = -log(P(영희|z_철수))- 2,3단계 아래 확인
- 최적화 목표:
- 임의보행에서 연속으로 나타나는 노드들의 임베딩을 가깝게
- 실제 이웃 노드로의 전이 확률 높이기
- 비이웃 노드로의 전이 확률 낮추기
- 특징:
- 지역적 구조 보존
- 확률적 접근
- 효율적인 학습
- 장점:
- 대규모 네트워크 처리 가능
- 점진적 학습 가능
- 병렬 처리 용이
- 구현시 고려사항:
def calculate_loss(walk, embeddings):
loss = 0
for i in range(len(walk)-1):
u = walk[i]
v = walk[i+1]
prob = softmax(dot(embeddings[u], embeddings[v]))
loss += -log(prob)
return loss이러한 방식으로 임의보행 기반 접근법은 네트워크의 지역적 구조를 효과적으로 포착하면서도, 확률적 모델링을 통해 더 유연한 임베딩 학습이 가능합니다.
2,3단계 설명
간단한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철수의 이웃: [영희, 지영]
- 각 노드의 임베딩 벡터 (2차원):
z_철수 = [0.8, 0.2]
z_영희 = [0.7, 0.3]
z_지영 = [0.3, 0.7]- 내적 계산 (z철수 x z다른노드):
z_철수 · z_영희 = (0.8 × 0.7) + (0.2 × 0.3) = 0.62
z_철수 · z_지영 = (0.8 × 0.3) + (0.2 × 0.7) = 0.38- exp(내적) 계산:
exp(z_철수 · z_영희) = exp(0.62) = 1.859
exp(z_철수 · z_지영) = exp(0.38) = 1.462- Softmax 계산:
분모 = Σ exp(z_철수 · z_w) = 1.859 + 1.462 = 3.321
P(영희|z_철수) = 1.859 / 3.321 = 0.56 (56%)
P(지영|z_철수) = 1.462 / 3.321 = 0.44 (44%)- 손실 계산 (-log 적용):
Loss = -log(P(영희|z_철수))
= -log(0.56)
= 0.579이해를 돕기 위한 핵심 포인트:
- Softmax가 필요한 이유:
- 내적값을 [0,1] 범위의 확률로 변환
- 모든 확률의 합이 1이 되도록 보장
- -log를 취하는 이유:
- 확률이 1에 가까울수록 손실 작아짐
- 확률이 0에 가까울수록 손실 커짐
- 올바른 예측 장려, 잘못된 예측 페널티
- 수치 예시:
높은 확률의 경우:
P = 0.9 → Loss = -log(0.9) = 0.105 (낮은 손실)
낮은 확률의 경우:
P = 0.1 → Loss = -log(0.1) = 2.302 (높은 손실)이렇게 계산된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임베딩을 학습하면, 실제 임의보행에서 자주 함께 나타나는 노드들의 임베딩이 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