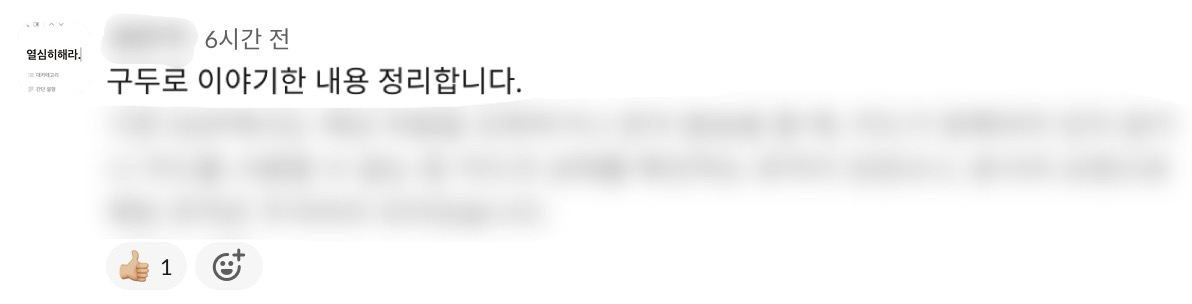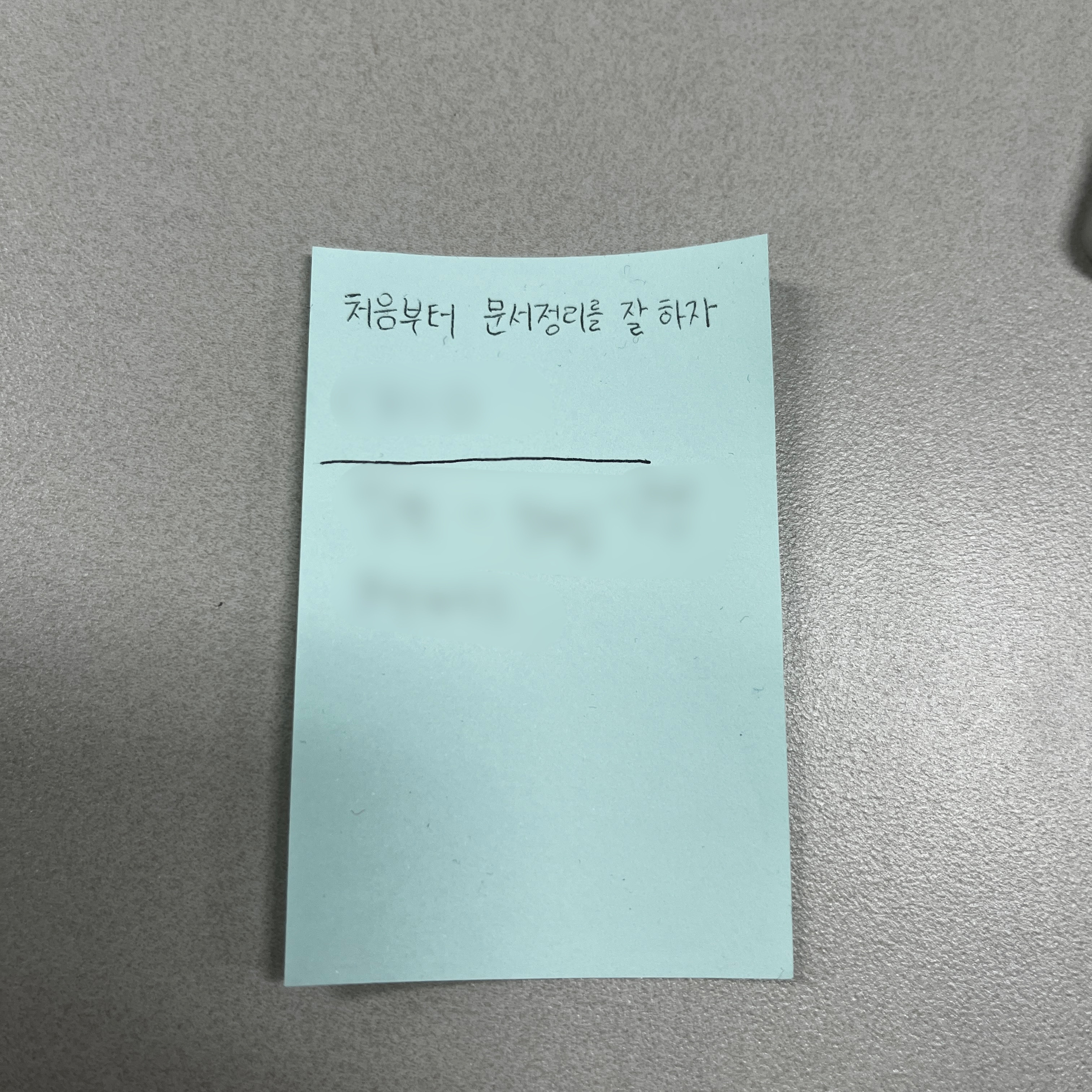“이 정도면?” 하고 어딘가에 적어두곤 했다. 그런데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 며칠 후의 나는 후회한다. 왜 대충 적었는가,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했는가, 그때의 나를 갈구고 싶다. 그 현장이 상세하게 기억에 남을 때 다른 테스크로 넘어가기 전에 적어야 한다. 만약 이동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발은 걷고 있어도 손은 기록하고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일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말했는지 잊어버린다. 내가 천재였으면 좋겠지만, 난 아니다. 기록은 나의 의견을 증거로 댈 때 유용하게 쓰인다. “예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아닌데…” 하는 순간 논쟁이 시작된다. 필요 없는 곳에 시간을 쓰는 거다. 적혀있다면 “여기!” 하고 한 마디만 하면 된다.
기록을 안 해서 나에게 실망한 사건이 2번 있었다. 첫 번째는 막 입사한 뒤, 구두로 정한 내용을 남겨두지 않은 것이다. A와 B 프로젝트를 동시에 하고 있다가 위의 책임자, 기획자 그리고 나의 결정으로 A만 진행하게 되었다. 10개월 정도 지나서 다른 팀원이 나에게 왜 B가 누락되었는지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나는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몇 번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 때 부끄러웠다. 두 번째는 큰 프로젝트가 끝난 뒤다. 3개월 정도 진행한 뒤 배포했다. 그런데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내가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관련 사항을 모두 노션에 남겨두려고 페이지를 여는 순간, ‘처음부터 잘할걸.’하고 후회가 밀려왔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노션에 포멧을 정해두고 기록을 쌓아뒀으면 굳이 모든 파일을 다 열어보고 옮기느라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노션에는 프로젝트 이행 기간, 목적, 담당자, 역할, 동작 방식, 정책, 이제까지 나온 Q&A를 정리해 두었다. 내 책상에는 “처음부터 문서정리를 잘 하자.”가 적혀있다. 나한테 화가 나서 이를 갈며 적었다.
하고 나면 남들에게 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 혼자 남겨둬도 남들이 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 작성했는지, 알아보기는 편한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작성한 뒤에 슬랙에 올리고 노션에 태그를 하지만, 사실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지 않거나 팀장급이 아닌 이상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흔치 않다. 나는 반대의 경우가 되었을 때 읽고 감상문을 댓글로 남기는 편이다.
마지막. 공개적인 글을 쓸 때는 맞춤법 검사를 꼭 해야 한다. 올바른 말을 해도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이제 다른 기록을 남기러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