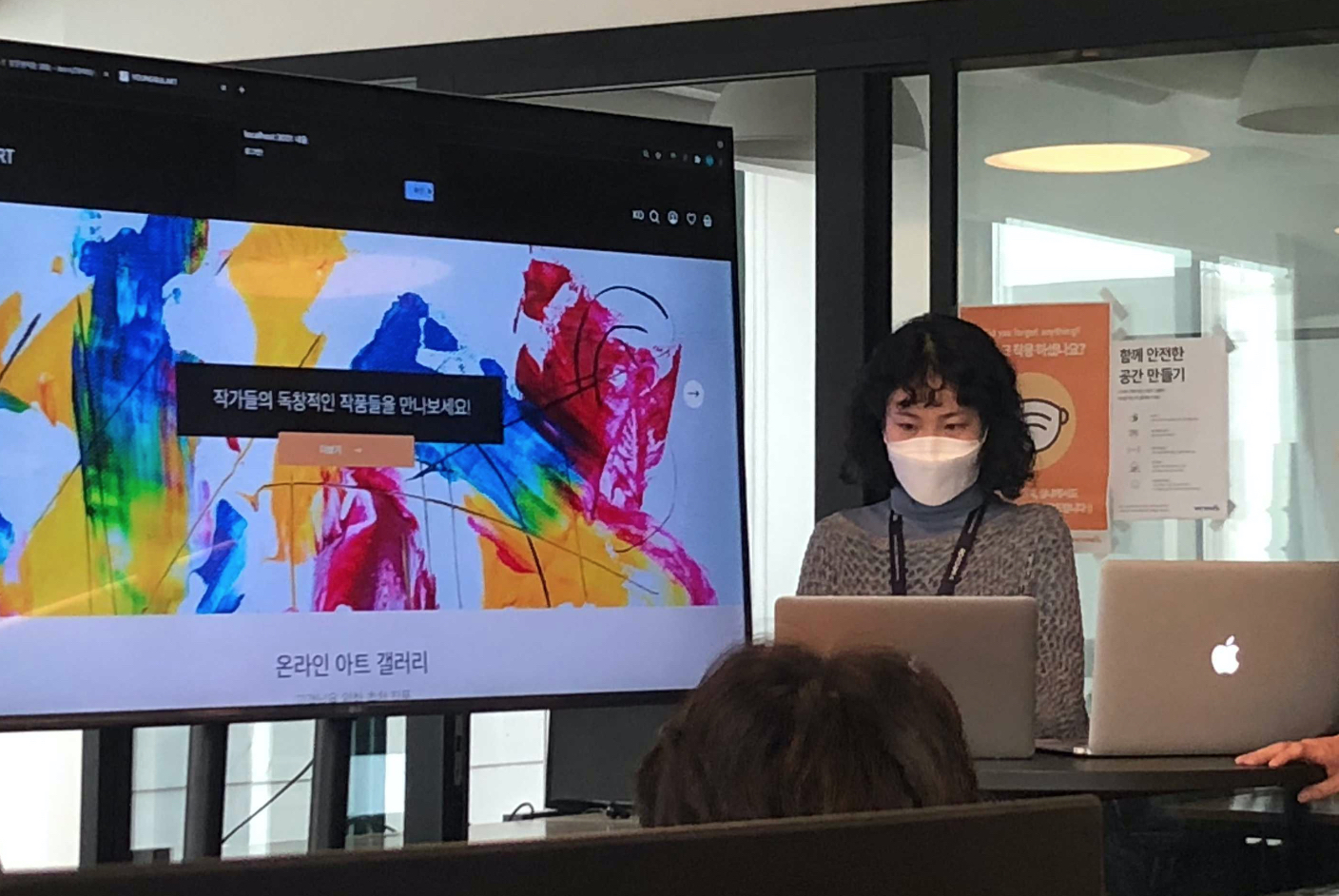코딩 부트캠프가 내게 준 것
국비 학원의 '풀스택(사실상 백엔드에 치중된)' 커리큘럼을 마친 후, 백엔드 개발자로 한 회사에서 인턴을 거친 나는 프론트앤드로서 포지션을 확정짓고 이후 3개월 기간의 코딩 부트캠프에 등록하게 된다.
이전 글에서 3개월이라는 기간에 내가 가진 최대한의 것을 쏟아보겠다 했는데, 실제로 이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에 몰입했던 적이 있었나싶을 정도로 코딩에 몰두했다.
새로운 기술스택을 배울 때나 기업협업 같은 완전히 낯선 환경에 무방비로 던져졌을 때 느꼈던 기분은 정말이지,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힘이 들었다.
그렇지만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승리한다'는 모토를 가슴에 깊게 새기고 왕복 3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일정이 시작되는 10시보다 최소 30분, 최대 1시간씩은 늘 먼저 도착해서 홀로 코딩을 했다.
그 만큼 나는 코딩을 잘 하고 싶었고, 또 잘 해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아침에 먹는 위워크 선릉점의 카푸치노는 꿀맛 ☕️
아침에 먹는 위워크 선릉점의 카푸치노는 꿀맛 ☕️
개발자의 숙명
나는 코딩이 재밌다. 코딩 하느라 시간가는 줄 모르는 때가 많다.
하지만 어떤 일을 직업으로 삼을 때는 단순히 '재미'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재미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어야 업으로 삼아 오래도록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진실, '재미'는 결국 없어지기 마련이므로.
선배 개발자들은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는 고민과 질문을 거듭하다 나름의 답을 내려보았다.
바로 평생 공부해야하는 직업이라는 것.
빠르게 변화하는 IT업계 중심에 서 있는 직업으로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개발자의 숙명이다.
평생 공부해야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끔찍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도태되고 그 상황에 고여버리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나로서는 이렇게 숙명적으로라도 공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개발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으며, 그렇기에 직업으로까지 선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선택 후에는 고민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개발자를 선택했으니 이제는 고민해야 할 차례이다.
"그렇다면 어떤 개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어떤 개발자가 될 것인가
사용자 가치 중심의 개발을 하는 개발자
이 말은 결국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과도 직결 되는데, 좋은 서비스란 결국 사용자가 의도한 바를 잘 수행하고 기대한 결과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UI, UX를 지녀야한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UI, UX가 곧 훌륭한 서비스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닐지 몰라도, 확실한 필요조건은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의 태도는 곧 모든 개발자가 '사용자 가치 중심'의 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로도 설명이 되며, 나아가 프론트앤드 개발자의 존재 가치로도 대변이 되는데, 사용자의 경험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포지션이 바로 프론트앤드이기 때문이다.
맷집이 강한 개발자
기업협업 인턴십 과정동안 나는 갑자기 둥지 밖으로 내던져진 아기새가 된 기분을 매 순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한 번도 다뤄본 적 없는 기술스택,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코드들을 마주 할 때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겁이 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상담 코치이신 영은님과 상담을 하기도 했었다. 많은 격려와 다정한 조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내 마음에 크게 울림을 준 말이 있다.
"잘 맞는 연습을 하세요."
개발자로 일을 하면, 어쩌면 일을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스택을 맞닥뜨려야할 텐데, 4주간의 인턴 기간 동안 맷집을 키워오라는 의미였다.
영은님의 조언 이후로 나는 '그래. 고작 이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면 앞으로 진짜 실무를 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하며 계속해서 마인드셋을 하며 상황을 버텨냈다.
그리고 당시의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기억과 그로 인한 극복의 의지는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다.
계속 맷집을 키워서 아무리 어려운, 처음 보는 기술스택에 맞더라도 '잘 맞는' 개발자가 되고싶다.
꾸준한 개발자
워렌버핏은 "지식은 복리처럼 쌓인다"고 했다.
개발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정말이지 뭐가 뭔지 하나도 알지 못 했다.
간단한 로직도 짜지 못 해서 매번 스택오버플로우를 전전했다.
사실 몇 개월 지난 지금도 당시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을 복기하면, 몇 개는 너무나 쉽게 느껴지는 반면, 몇 개는 여전히 확신이 서질 않는다.
나는 개발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 매일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나는대로 계속해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어쩌면 또 마주할지도 모르는 에러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아카이빙하는 습관을 들이고자 노력했다.
언젠가는 몰랐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기를 꿈꾸며, 꾸준히 개발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원동력을 얻고 있다.
같이 일하고 싶은 개발자
개발자가 개발을 잘해야하는 것은 무척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초반에는 개발을 잘 하는 것이 개발자가 지닌 최고의 덕목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팀프로젝트를 다섯 번 정도 거친 지금, 그 생각은 조금 달라졌다.
개발을 잘 하는 사람이 반드시 같이 일 하고 싶은 개발자는 아니라는 것.
결국 프로젝트를 대하는 태도가 좋은 사람이 곧 같이 일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판단과 함께, 개발 역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지고 좋아질 수 있지만,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곧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과연 나는 같이 일하고 싶은 개발자인가?"
앞으로 있을 수많은 프로젝트 속에서 내가 가장 촉을 세워 집중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태도를 통해 같이 일 하고 싶은 개발자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