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직히 말해,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피곤함이 싫지만은 않았다.
1. 이상하게 싫지 않은 피곤함
수험 생활 때도 잠을 줄여본 적 없는데, 이번 4주간은 매일같이 새벽 감성을 즐기며 살았다. 자려고 시계를 보면 새벽 3시.

몸은 지쳤는데, 머릿속은 계속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었다. 마스터님들은 "챌린지"가 우리가 아는 그 단어, challenge 그대로의 의미라고 했다. 때로는 넘어야 할 도전, 때로는 나를 막막하게 만드는 벽.
"챌린지는 이름 그대로 챌린지입니다." — 마스터님 曰
네, 맞아요. 제 멘탈이 제대로 챌린지 당했습니다.
2. 매주 새로 뽑는 파티원, 4개의 던전
부스트캠프는 매주 새로운 스터디 그룹, 즉 파티를 배정받아 미션을 깨야 했다. 매주 다른 던전에 입장하는 기분이었다.
🗓️ 1주차 – 튜토리얼 구간
첫 주는 말 그대로 튜토리얼 모드. 활기차고 좋은 팀원들 덕에 부담 없이 적응하며 "아,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감을 잡았던 시간이었다.
💥 2주차 – 보스몹을 만났다!

2주차에 만난 한 팀원은… 그냥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출제자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풀지?"를 고민할 때, 그분은 "출제 의도는 이렇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을 이야기했다.
특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 나온 미션은 내게 거대한 난관이었다. 그때 그분이 피어 세션에서 미니 강의를 열어주셨고, 이해도가 50%에서 120%로 수직 상승했다.
문제는 그와 동시에 느껴지는 거대한 격차였다.
나는 "음, 그런가 보다"로 끝나는 사람인데, 그분은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그 깊이가 진심으로 부러웠다.
그래서 나만의 생존법을 만들었다.
- 질문 꼬리잡기: 대답을 들어도, 모르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파고들기
- 질문 마인드맵: 하나의 주제에서 질문 뽑아내기 연습
🤝 3주차 – 소통과 시너지, 최고의 파티플레이
이때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다. 다들 마음이 잘 맞아 기술적인 대화부터 시시콜콜한 농담까지 오갔다. 덕분에 나도 쫄보 모드를 해제하고 가장 많은 말을 했던 것 같다. "아, 이게 진짜 협업의 시너지구나"를 느낀 주였다.
🚀 4주차 - 내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
마지막 주는 그냥 폭주기관차였다. "에이, 이왕이면 어렵게 가자"는 마음으로 달렸다. 실패가 두렵지 않았고, 그 과정 자체가 성장의 재미라는 걸 깨달았다. 부스트캠프에서는 구현을 포기하고 학습에 집중하는 것 또한 하나의 전략으로 인정해주었기에, 더 용감하게 부딪칠 수 있었다. 챌린지의 참맛을 본 기분이랄까.

"이게 챌린지의 참맛인가 봅니다."
— 4주차 새벽 2시, 커피 3잔째의 나
3. 나만의 공략집: Learning by Doing과 AI
부스트캠프는 정답을 친절하게 떠먹여주지 않는다.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는 환경이기에, 자연스럽게 Learning by Doing을 체득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원래 내가 하던 방식이기도 했다. 새 앱을 깔면 모든 버튼을 눌러보고, 기능을 직접 부딪쳐서 익히는 타입이라서.

AI도 처음엔 편해서 바로 답을 물었지만, 이건 학습에 도움이 안 됐다. 직접 부딪치는 탐색의 과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만의 AI 활용 공략을 만들었다.
나만의 AI 활용법 📝
나: "나 지금 A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탐색 키워드 좀 추천해줄래?"AI가 길잡이 역할만 하고, 나머지 탐험은 직접 하는 방식.
이 반자동 방식이 내게 훨씬 잘 맞았다.
4.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 '궁금하지 않은 나'
이번 챌린지에서 가장 뼈아프게 마주한 건,
내가 뭘 봐도 잘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오케이" 하고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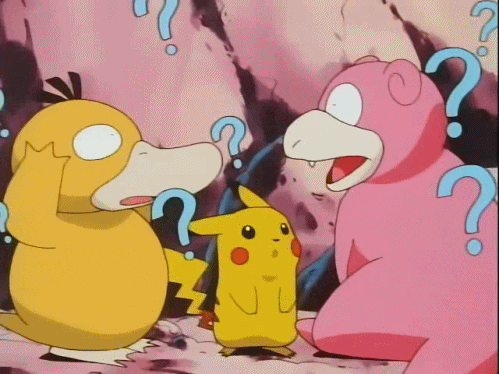
이게 질문 능력 부족으로, 또 소통의 깊이를 막는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요즘은 억지로라도 "왜?"를 붙여보는 연습을 하고 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3주차 때 나도 모르게 "내일 OOO님은 또 그 방식 쓰시려나?" 궁금해했던 순간은 내게 엄청난 변화였다. 환경이 갖춰지면, 나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
5. 🏆 결론: 이 챌린지는 최고의 '성장 패치'였다
지난 4주 동안 나는,
- ☑️ 피곤했고
- ☑️ 멘탈이 털렸고
- ☑️ 분명히 성장했다
챌린지는 그냥 과제가 아니었다.
나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인생의 강제 업데이트 패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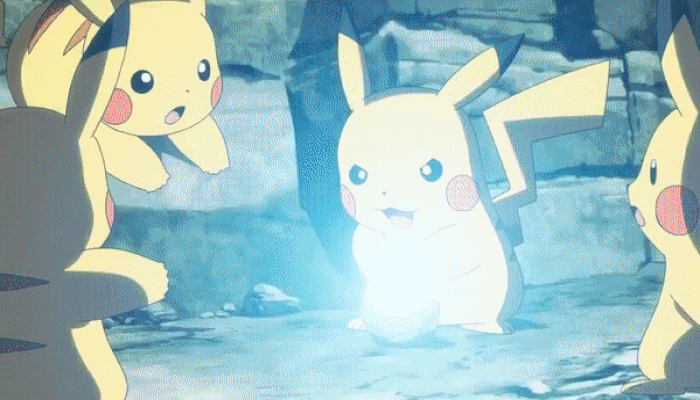
혹시 다음 퀘스트를 기다리는 예비 캠퍼가 있다면, 두려워 말고 일단 '새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라고 말해주고 싶다. 분명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
